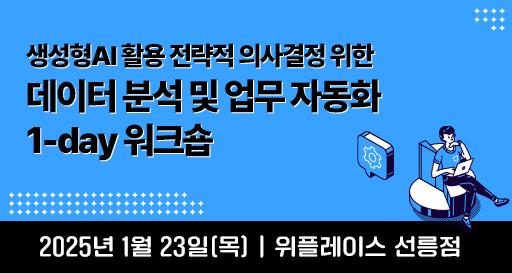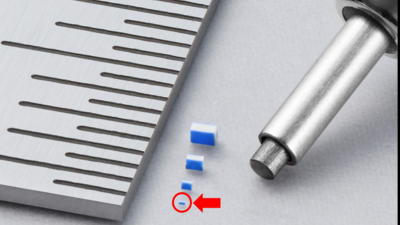최근 에너지 전환 사례 취재차 독일을 찾았다. 독일은 1980년대부터 '에네르기 벤데(에너지 전환)' 기치 아래 전환 정책을 추진했다. 2000년대 들어 신재생 지원 등 지금의 에너지 제도가 자리 잡았다. 그 결과 현재 전체 전력 가운데 약 40%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으로 공급한다.
주목할 것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독일 국민의 '이해'다. 독일 국민이 부담하는 평균 전기요금은 2006년 ㎾h당 19.46ct(유로센트)에서 지난해 29.42ct로 증가했다. 전체 전기요금 가운데 30%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구매 보상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가정용 요금과 비교하면 4배 정도 비싸다.
그럼에도 지난해 포츠담 지속가능연구원(IASS)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85%가 '에너지 전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독일 국민도 전기요금이 비싼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럴 만 하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전환을 앞두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우려를 환경 편익으로 상쇄한다고 인정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화석연료,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현실화하면 향후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 미세먼지가 극심해 석탄화력 가동을 줄이면 가스복합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전력 구매 가격이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르는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주력 산업군에 포진했다. 국민도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에 부정적이다. 전기요금 급상승은 또 다른 문제와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짙다.
반대로 발전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전기요금이 여전히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석탄화력을 줄이려면 전기요금 인상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3차 에너지기본계획 성패는 전기요금을 둘러싼 다양한 요구에 대해 균형을 어떻게 잡는가에 달렸다. 정부가 무거운 짐을 졌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