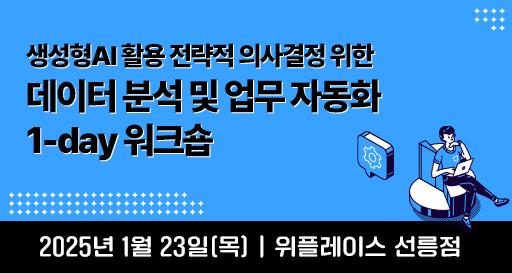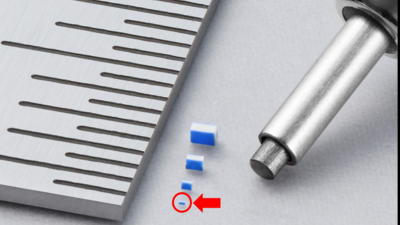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창업 지원 정책을 내놓은지도 꽤 됐다. 입지 정보에서부터 교육, 자금, 사업화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창업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지원 대상도 다양하다. 초중고교생은 물론 대학생과 시니어, 여성, 일반인, 장애인 등 사회 계층 전반에 걸친 정책이 총 망라돼 있다.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창업 불씨는 좀처럼 타오르지 않고 있다. 한 때 창업의 중심 축이었던 벤처 설립도 시들하다.
대학의 역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10여년 전 국내 대학들은 벤처의 산실인 창업보육센터(BI)를 앞다퉈 설립하면서 창업의 요람으로 떠올랐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도 한 몫 했다. 부지만 확보되면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과 운영 자금을 일정부분 지원했기 때문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창업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잘만 하면 힘들이지 않고 학교에 재산이 될 만한 건물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열풍도 오래 가지 못했다. 갈수록 정부의 자금이 줄어들고 창업 열기도 식어가면서 대학의 의지도 많이 변질됐다. 언제부터인가 돈이 안 된다는 생각에 학교측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이는 부실 운영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평가를 통해 옥석 가리기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중소기업청이 올 초 선정한 ‘창업선도지원대학’에 많은 수의 대학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다. 선정 과정에서 대학측의 로비는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오죽하면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 브리핑에서 평가 총책임자까지 나와 심사 공정성에 대해 발표를 했을 정도다.
그동안 창업 지원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대학들이 이렇게 새삼스럽게 태도가 변한 이유는 다름 아닌 정부의 지원 자금에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적어도 1년간 20억여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 마디로 돈이 되는 사업이다.
창업은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역동적인 경제 지표다.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들이 정부 자금에 눈이 팔려 창업 지원을 결정하는 잣대로 삼는다면 한국형 스티브잡스와 빌게이츠 배출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콘텐츠칼럼]게임 생태계의 겨우살이
-
2
[ET단상] 자동차산업의 SDV 전환과 경쟁력을 위한 지향점
-
3
[ESG칼럼] ESG경영, 변화를 멈출 수 없는 이유
-
4
[ET톡]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희망고문
-
5
[ET시론]정보화 우량 국가가 디지털 지체 국가, AI 장애 국가가 되고 있다
-
6
[人사이트]박세훈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장 “국산 고성능 의족, 국내외 보급 확대”
-
7
[김종면의 K브랜드 집중탐구] 〈29〉프로스펙스, 우리의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다
-
8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AX의 시대와 새로운 디지털문서&플랫폼 시대의 융합
-
9
[기고] '티핑포인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
10
[김태형의 혁신의기술] 〈21〉혁신의 기술 시대를 여는 서막(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