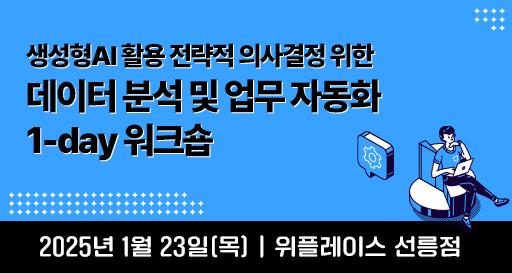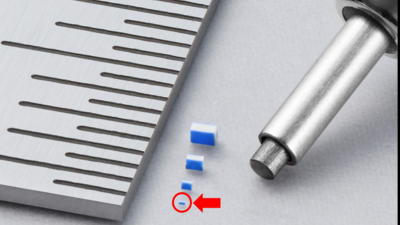18일(현지시각) 개막된 ‘E3 2005’의 최대 화두는 뭐니뭐니 해도 차세대 비디오게임기다.
‘X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2(PS2)’로 1차 전쟁을 벌였던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소니가 개막 직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차세대 게임기인 ‘X박스 360’와 ‘PS3’를 발표해 로스앤젤레스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실사에 가까운 동영상을 보여주는 두 게임기에 참관객들을 넋을 잃을 지경이다. 그야말로 ‘슈퍼컴’급 게임기에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MS와 소니가 이처럼 차세대 게임기에 사활을 거는 것은 결국 게임기가 거실로 나와 홈네트워크를 관장하는 핵심 서버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미래 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두 공룡업체의 싸움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협감마저 느껴질 정도다.
그러나 이런 비디오 게임기의 고사양화로 게임 개발업체들은 또 다른 고민을 떠안게 됐다. 바로 제작비의 상승이다. 게임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의 한계가 날로 높아지면서 편당 게임 제작비는 급상승해 왔다. 한 편의 게임 제작에 투여되는 비용이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의 제작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에 비춰볼 때 E3에서 선보인 차세대 게임기의 등장으로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은 명약관화하다.
제작비가 높아질 경우 소규모 업체들은 불어나는 제작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국내 현황에서 봤을 때 게임기의 고사양화는 그다지 반길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 가정용 게임기 게임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의 게임기 등장에 국내 업체들은 그냥 넋 놓고 있을 수밖에 없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바야흐로 이제 게임업체도 기술력뿐 아니라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 시대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업계도 인수·합병(M&A)의 활성화를 통해 볼륨을 키우는 작업을 본격화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세계 3대 게임강국이라는 마스터플랜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미국의 EA나 일본의 세가 등과 맞먹는 대형 게임사의 등장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업체들의 노력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때라고 본다.
로스앤젤레스(미국)=디지털문화부·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콘텐츠칼럼]게임 생태계의 겨우살이
-
2
[ET단상] 자동차산업의 SDV 전환과 경쟁력을 위한 지향점
-
3
[ESG칼럼] ESG경영, 변화를 멈출 수 없는 이유
-
4
[ET톡]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희망고문
-
5
[ET시론]정보화 우량 국가가 디지털 지체 국가, AI 장애 국가가 되고 있다
-
6
[人사이트]박세훈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장 “국산 고성능 의족, 국내외 보급 확대”
-
7
[김종면의 K브랜드 집중탐구] 〈29〉프로스펙스, 우리의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다
-
8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AX의 시대와 새로운 디지털문서&플랫폼 시대의 융합
-
9
[기고] '티핑포인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
10
[김태형의 혁신의기술] 〈21〉혁신의 기술 시대를 여는 서막(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