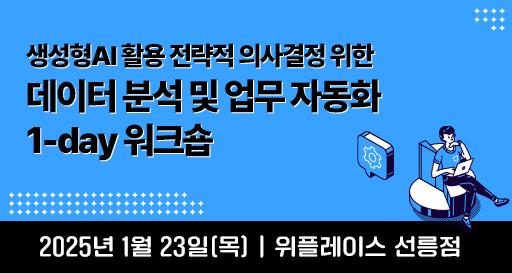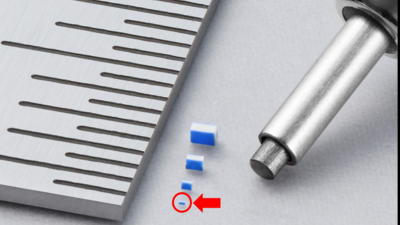위피(WIPI)가 새롭게 출발선에 섰다.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국산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 위피가 모든 단말기에 의무 탑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업계에서는 위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위피폰은 순조롭게 보급되고 있으며, 콘텐츠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SK어스링크가 미국에서 위피를 플랫폼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외 진출 성과도 일궈냈다. 중국과 동남아 쪽의 관심도 높다. 오는 5일 영국에서 열리는 모바일 국제 콘퍼런스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과 OS 2005’에 자바·브루와 동등한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유망주이던 위피가 어느덧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대표급 선수로 커가고 있다. 위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찮다. 위피 활성화의 한 축을 맡을 콘텐츠제공업체(CP)들은 역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기존 플랫폼용 콘텐츠도 만들어야 하고, 위피용 콘텐츠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이 곱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콘텐츠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휴대폰 보급만 늘면 사용자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며 “위피의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원래의 개발 의도를 맞추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비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낙관이나 비관만 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위피를 시장에 안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이통사·플랫폼제조사·콘텐츠업체 등 관련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뜻을 모아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도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일 정부·산업계·연구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피진흥협회(WIPIA) 창립 총회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위피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피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 어떤 성적을 낼지는 지금부터 하기에 달렸다. 위피가 유망주가 아닌 진정한 국가대표로 성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이다.
IT산업부·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콘텐츠칼럼]게임 생태계의 겨우살이
-
2
[ET단상] 자동차산업의 SDV 전환과 경쟁력을 위한 지향점
-
3
[ESG칼럼] ESG경영, 변화를 멈출 수 없는 이유
-
4
[ET톡]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희망고문
-
5
[ET시론]정보화 우량 국가가 디지털 지체 국가, AI 장애 국가가 되고 있다
-
6
[人사이트]박세훈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장 “국산 고성능 의족, 국내외 보급 확대”
-
7
[김종면의 K브랜드 집중탐구] 〈29〉프로스펙스, 우리의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다
-
8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AX의 시대와 새로운 디지털문서&플랫폼 시대의 융합
-
9
[기고] '티핑포인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
10
[김태형의 혁신의기술] 〈21〉혁신의 기술 시대를 여는 서막(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