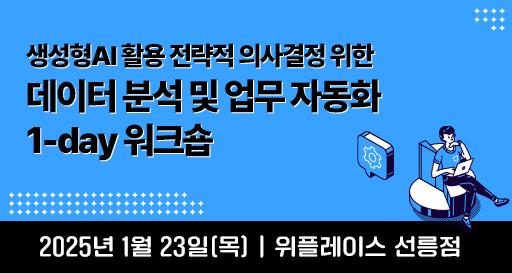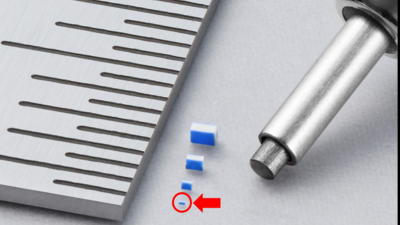지난달 18일 프레스투어 일환으로 판문점이라 불리는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았다. 그때만 해도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은 크지 않았다. 이미 핵무기를 완성한 북한이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짙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영화 속에서만 보던 판문점 T1~3 건물을 직접 보고도 그리 놀라지 않았다. 100여m 앞에 있는 북한군 모습도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북한의 대남 방송과 유엔군이 설명하는 판문점의 역사를 곱씹으며 여전히 북한은 적대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7일 오전 9시 28분. 일주일 전 기자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려는 희망으로 변했다. 기자로서 지켜야 할 냉철한 이성보다는 따스한 감성이 앞섰다.
“선은 넘으라고 존재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어린 시절 책상 중간에 선을 긋고 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던 같은 반 여자 아이도 어렴풋이 생각난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선은 지워지기 마련이었다.
남과 북을 갈라놓은 선도 언젠가는 지워질 것이다.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지워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초석을 놓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퍼포먼스는 역사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다시 냉철한 이성을 되찾을 때다.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핵 폐기를 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처럼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한반도의 항구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첫 시발점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야당을 위시한 국민 합의를 끌어내는 일이다.
남북 정상회담 당일 문 대통령의 진심이 김 위원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 역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