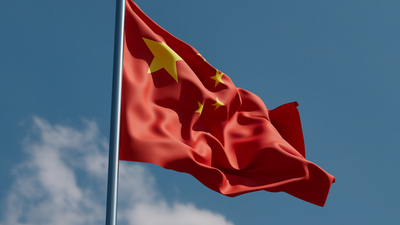윤건일
국내외 기업들의 CEO나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한국 시장은 첨단 IT·전자제품을 선호해 우리 신제품을 가장 먼저 출시하는 곳입니다.” “한국은 IT제품의 테스트 베드로서 가장 주목받는 시장입니다.”
거창하게 들리지만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판매도 잘될 것 같다는 소리다. 맞는 말이다. 첨단 제품을 가장 먼저 사는 ‘얼리어답터’가 존재하고,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프로슈머’가 있는 곳이 우리나라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겪으면 어떨까.
`울산에 사는 신용식씨(51)는 2003년 6월 900만원을 들여 삼성전자 50인치 PDP TV를 구입했다. DNIE라는 화질 개선 칩과 DVI 단자 등 첨단 사양에 끌려 같은해 5월 출시되자마자 샀다. 그런데 신씨는 요즘 TV만 보면 속이 터진다. 900만원짜리 TV가 다른 영상기기와 호환이 안 되는 것이다. 삼성제품과는 문제가 없는데 샤프나 빅타등 타사제품과는 화면이 불안정했다. 제조사측은 처음 타사제품이 문제인줄 알았으나 단자의 호환성문제임을 확인하고 SW로 이를 보완했다.`
이럴 땐 그럴 듯해 보였던 ‘테스트 베드’란 말이 정말 시험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시험 대상이 됐다는 불쾌감 때문인지 혹자는 마루타가 됐다는 격한 표현도 쓴다.
그런데 화난 사람은 달래 주고 꼬인 실타래는 풀면 되는데 이를 당당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덮으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최근 불거진 슬림 브라운관 TV 문제가 그렇고 50인치 PDP에 불량이 발견돼 이를 조용히(?) 회수한 사례가 그렇다.
한 제조업체 사장은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 개발을 하긴 했지만 문제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많으니까 그들이 빨리 오류나 단점들을 발견해 줬으면 합니다.”
어차피 국내 시장을 ‘테스트 베드’로 인식한다면 제기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디지털산업부·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