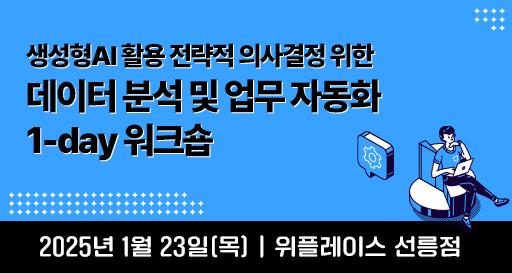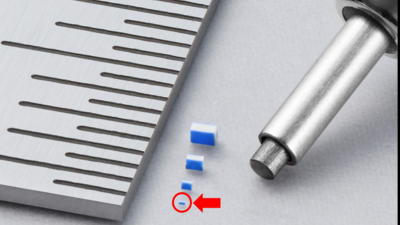근대 이후 세계 정치·군사적 패권은 늘 서쪽을 향했다.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다시 미국으로…. 경제와 산업 역시 똑같은 길을 걸었다. 특히 제조업 패권의 서진(西進)은 뚜렷하다.
미국의 제조업 주도권은 20세기 후반 일본으로 넘어갔다. 다음은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4룡이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중국이 바톤을 넘겨받았다. 중국 제조업의 힘이 워낙 막강해 서진 공식도 이젠 끝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인도가 떠올랐다. 소프트웨어(SW)·영화 등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과 바이오·우주항공 같은 미래지향적 산업을 앞세워 강력한 도전자로 나타났다. 물론 인도가 중국의 제조업을 당장 쫓아갈 순 없을 것이다. 제조업 기반이 아직 미약해 일본·한국과도 대등한 경쟁을 하지 못한다.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제조업 패권 이양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인도가 이렇게 빨리 부상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인도의 추격이 예상 밖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제조업 서진 공식에서 흥미로운 것은 단초를 늘 1인자가 제공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육성했지만 결국 3인자로 몰락했다. 일본은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견제하려고 대만을 키웠다가 부메랑을 맞았다. 일본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집중했다가 중국이 크는 데 밑거름 노릇만 했다.
중국으로서는 서진 공식이 종식되길 바라겠지만 희망사항일 뿐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세계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도를 우군으로 끌여들이려 한다. 매개체는 제조업이다. 원자바오 총리의 인도 방문이 이를 그대로 보여줬다. 인도는 경제 균형과 고용 창출을 위해 제조업 육성에 대한 기치를 올렸다. 벌써 한국에도 제휴 손짓을 보내고 있다.
중국은 협력하는 시늉만 하고 제조업 패권만큼은 인도에 넘겨주지 않을 속셈이다. 하지만 중국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새로운 서진 공식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신화수차장@전자신문, hsshin@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콘텐츠칼럼]게임 생태계의 겨우살이
-
2
[ET단상] 자동차산업의 SDV 전환과 경쟁력을 위한 지향점
-
3
[ESG칼럼] ESG경영, 변화를 멈출 수 없는 이유
-
4
[ET톡]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희망고문
-
5
[ET시론]정보화 우량 국가가 디지털 지체 국가, AI 장애 국가가 되고 있다
-
6
[人사이트]박세훈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장 “국산 고성능 의족, 국내외 보급 확대”
-
7
[김종면의 K브랜드 집중탐구] 〈29〉프로스펙스, 우리의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다
-
8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AX의 시대와 새로운 디지털문서&플랫폼 시대의 융합
-
9
[기고] '티핑포인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
10
[김태형의 혁신의기술] 〈21〉혁신의 기술 시대를 여는 서막(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