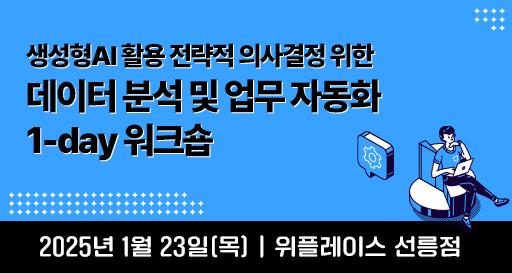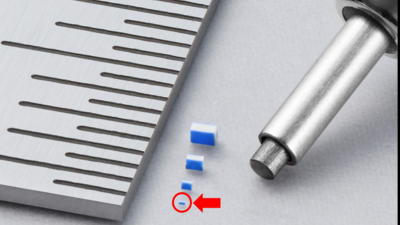3년 전만 해도 벼랑 끝에 섰던 에릭슨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스웨덴 간판 기업이자 세계 최대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제공업체인 에릭슨은 △휴대폰 사업 실패 △빚덩이 통신사업자에 대한 투자 실패 등으로 3년 전만 해도 깊은 수렁에서 신음했었다.
실제 지난 2001∼2003년 에릭슨의 세전 손실은 640억크로나나 됐다. 이 같은 막대한 적자는 결국 5만7000명의 해고로 이어졌고 300억크로나나 되는 막대한 돈을 새로 충당해야만 했다. 주가도 덩달아 폭락해 최고 절정기 230크로나(2000년 3월)에서 2003년 9월에는 3크로나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나락으로 치닫던 에릭슨은 올 1월 “지난해 4분기 기록적인 분기 실적을 올렸다”며 깜짝 발표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에릭슨의 신용 등급도 투기수준인 정크에서 상향조정됐다. 급기야 이달 있을 이사회에선 2000년 이래 처음으로 배당금 지급도 의결할 예정이다.
에릭슨의 이 같은 반전에는 칼 헨릭 스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있었다. 관측통들은 “스벤버그의 전임자인 쿠르트 헬스트롬이 일궈낸 것도 있지만 2년 전 에릭슨의 대권을 거머진 스벤버그의 공로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60년 만에 첫 외부 인사인 스벤버그=그는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에릭슨이 처음으로 외부에서 영입해온 CEO이다. 통신산업 쪽에 경험도 없다. 에릭슨 대주주인 발렌버그 가족과도 인연이 깊지 않다. 이런 이유로 2년 전 그가 에릭슨의 CEO로 임명됐을 때 회사 안팎과 언론에선 “의외의 깜짝 인사”라며 놀라워했다.
스벤버그는 주위의 우려를 불식하며 현재 회사는 물론 언론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언론과의 좋은 관계는 전임 CEO가 취약했던 부분이다. 스웨덴 사람 10명 중 1명은 에릭슨 주식을 갖고 있을 만큼 에릭슨은 스웨덴에서 화제의 대상인데 한 주주는 “스벤버그의 경영 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스벤버그 자신도 “나의 관심사는 오직 회사뿐이다”면서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스벤버그의 과제=하지만 에릭슨을 침몰 직전에서 구해낸 스벤버그의 향후 과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 통신업체들이 에릭슨의 텃밭인 유럽을 향해 거세게 돌진하고 있다. 특히 화웨이가 무서운 적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화웨이는 98년부터 에릭슨의 고객이었던 텔포트(네덜란드 통신사업자)에 장비를 공급하며 에릭슨을 따돌렸다.
이에 대해 스벤버그는 “아시아 경쟁자들이 부상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도 비용 절감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자사 공급망의 75%를 중국에 두고 있는 에릭슨은 최근 서비스 부문 사업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올 1월에는 이탈리아의 전3G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따내기도 했다.
스벤버그는 “전세계 네트워크의 2%만이 아웃소싱되고 있다”면서 “이 시장은 향후 연평균 10%씩 성장할 것”이라면서 서비스 사업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향후 에릭슨 그룹과 사업모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그는 소니와 50 대 50 지분으로 설립한 휴대폰벤처업체인 소니/에릭슨에 대해 “소니와 결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항간의 결별설을 일축하면서 “소니에릭슨과의 관계가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아이폰SE4?…아이폰16E?… 하여튼 4월엔 나온다
-
2
영상 1도에 얼어붙은 대만… 심정지 환자만 492명
-
3
올가을 출시 '아이폰17' 가격 더 오른다는데…왜?
-
4
“그래도”…한국, 군사력 랭킹 세계 5위, 北 34위… 1위는 미국
-
5
美서 또 보잉 사고…엔진에 불 붙어 200여 명 비상대피 [숏폼]
-
6
LA산불에 치솟는 '화마'(火魔)… '파이어 토네이도' 발생
-
7
팬티 바람으로 지하철 탄 런던 시민들, 왜? [숏폼]
-
8
실수로 버린 '1조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찾는 남성 [숏폼]
-
9
미국 LA 산불, 불길 시내쪽으로 확산
-
10
애플, 영국서 2조7000억원 집단소송… “앱스토어가 반독점 위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