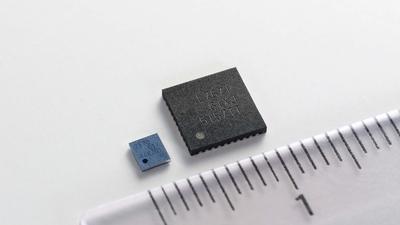반도체·통신기기와 함께 전자 분야의 3대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PC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세계 PC 수요가 회복 무드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메이저 업체의 해외 시장 PC 출하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최근 수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체 IT품목은 작년에 비해 16% 성장했다. 그러나 PC는 지난 해에 비해 무려 62.1%나 감소한 4000만달러에 그쳤다. LCD를 포함한 모니터 역시 11.4%나 감소했다. 산업자원부도 3대 수출 품목 중 하나였던 PC가 지난 3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다고 잠정 집계했다.
반면 해외 PC시장은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는 3분기 전세계 PC 시장이 작년에 비해 9.7% 증가, IDC는 11.9% 증가해 PC가 IT시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를 뒷받침하듯 다른 나라의 PC수출은 날개를 달았다. 일본 전자정보산업협회는 3분기 중 자국의 PC수출이 지난 해보다 1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인도의 PC 출하 대수도 평균 9∼10% 성장했다는 보고서도 줄을 잇고 있다.
우리 PC업체들이 고전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조립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등 기존 수출전략이 한계에 왔음을 의미한다. 생산 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국과 대만, 인도까지 가세하면서 국내업체의 입지가 위축된 것이다.
돌파구는 하나, 수출품의 고부가화 전략이다. 다행히 삼성·LG전자 등 간판 전자업체들이 3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OEM보다는 자체 브랜드를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강화전략을 밝히고 나섰다.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앞선 기술력이다. 마케팅과 가격도 중요하지만 내수가 한겨울인 상황에서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이미 세계 PC시장은 내로라하는 ‘메이저’들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기술력을 통한 차별화 말고는 경쟁력 회복의 길이 없다. 다시 출발선에 섰다는 각오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다행히 우리에겐 한때 PC강국이었다는 저력이 있지 않은가.
컴퓨터산업부=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사설] K-소부장 내재화는 계속돼야 한다
-
2
[데스크라인] OTT 정책, 잃어버린 10년
-
3
[ET시론] 생성형 AI와 글로벌 교육계의 대응
-
4
[ET시론] AI, 인프라에서 시장과 산업으로
-
5
[ET톡]'닥터나우 방지법'과 정부 신뢰
-
6
[김종면의 브랜드 인사이트] ① K브랜드 열풍의 현주소… 세계가 열광하는 K브랜드, 그 빛과 그림자
-
7
[보안칼럼] 매출 10% 과징금 시대의 생존법
-
8
[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36〉분산 에너지에 대한 초급 입문
-
9
[혁신플랫폼톡]개인사업자, 세금 그리고 AI
-
10
[人사이트]손도일 율촌 경영대표 “게임 규제 부담 완화해야... AI 경쟁 시대 대비 필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