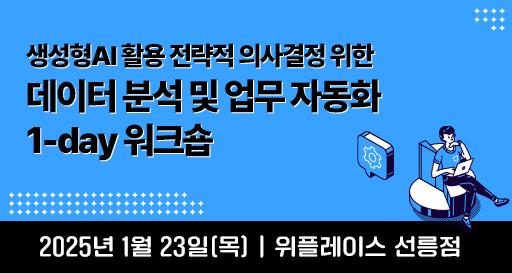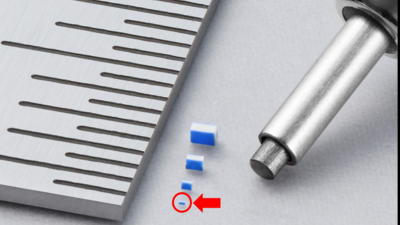한국은 창업의 나라다. 준비된 창업가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 준다. 투자 환경도 좋아졌다. 벤처 투자액도 전년 대비 50% 이상 늘었다. 액셀러레이터 등록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 덕분에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창업 생태계 확대에 열쇠를 쥔 민간 출신 사령탑 열정도 대단하다. 웬만한 스타트업 대표를 능가한다. 취재 현장을 누비며 감동받은 창업 지원기관 관계자 이름을 한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다.
이들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근사한 창업 환경을 꾸며도 청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의미가 반감된다. 거액을 들여 과외를 시켜도 공부에 흥미가 없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이 되는 것보다 창업이 훨씬 낫다는 걸 확인시켜 줘야 한다. 그러려면 동경의 대상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내 자산 순위 상위 30명 가운데 29명이 창업자로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중국 전역 창업가, 대학생들에게 되고 싶은 롤 모델이 됐다. 미국도 10위권 내 창업자가 6명이나 된다.
반면에 국내는 상위 30명 가운데 7명만 창업자다. 대부분 창업한 지 10년이 지난 회사 대표다. 더 큰 문제는 이 순위표에 이름을 올릴 새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벤처 신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반열에 오르기엔 규제 장벽이 너무 높다. 하루가 다르게 변신하는 스타트업 근로 환경을 20세기에 만들어진 노동법으로 좌지우지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신산업 보호 정책도 턱없이 부족하다.
업체 간 갈등도 심각하다. 스타트업은 사업 특성상 기존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기치로 문을 연다. 기존 업체와 마찰이 불가피하다. 우리 사회는 이 같은 논란이 일 때마다 기존 산업 편을 들어왔다. 공유경제 기반 스타트업이 기를 펴지 못하는 이유다.
좋은 창업 판은 깔렸다. 넘쳐 나는 예산, 훌륭한 조력자가 생태계를 든든히 받치고 있다. 이제는 청년 가슴을 뛰게 할 차례다. 롤 모델 등장을 가로막는 규제, 기존 산업 간 갈등을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한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