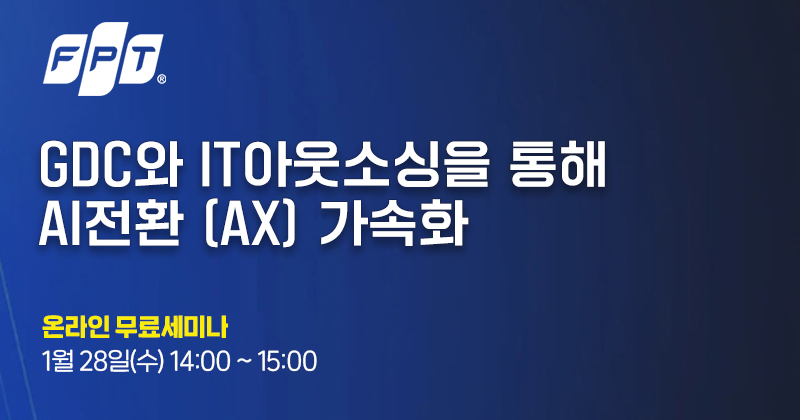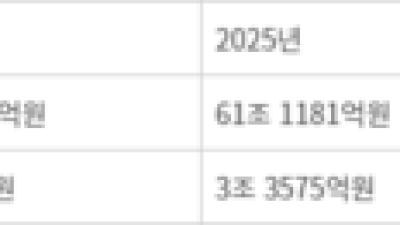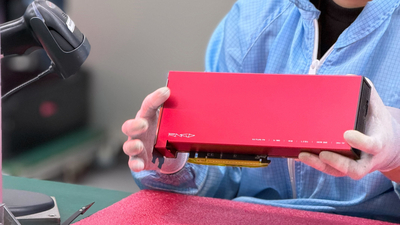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와 흑연 등 핵심광물을 외교·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정·제련과 가공 역량을 자국 또는 우방국 중심으로 옮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기존 수입 구조를 점검하고,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중국은 갈륨·게르마늄·흑연·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응해 희토류와 흑연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일본과의 외교 갈등 과정에서도 관련 품목 통제를 강화했다. 현재 희토류와 흑연 정·제련 분야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90% 안팎에 달한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 내 생산 확대'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핵심광물 확보를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광산 개발부터 정·제련, 재활용까지 전 주기 공급망을 미국 내에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희토류 생산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해저광물 개발 승인, 광물 생산 촉진 행정명령 등을 잇따라 시행하며 공급망 내재화에 나서고 있다. 다자 협력보다는 호주·일본·우크라이나 등과의 양자 협력 강화가 특징이다.
EU의 움직임이 빠르다. 2024년 '핵심원자재법(CRMA)'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핵심광물의 40%를 역내에서 정·제련하고, 25%를 재활용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총 280억유로 규모의 60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리튬·희토류·흑연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착수했다. 채굴부터 가공, 재활용까지 전 단계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원 부존량이 적고 정·제련 기반도 제한적인 만큼 동일한 방식의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전략광물을 선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야 한다는 게 KEIT 제언이다.
또 국내 정·제련이 가능한 분야와 해외 의존이 불가피한 분야를 구분한 뒤, 해외 자원개발과 재자원화, 대체소재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배터리·반도체·수소산업과 직결되는 광물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포스코의 리튬·흑연 투자 사례처럼 민관 협력을 통한 공급망 구축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꼽힌다.
현재 정부는 공급망 3법 시행을 통해 핵심광물 관리 체계를 마련했고,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을 전략광물로 지정해 비축과 조기경보체계를 운영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은 독자적 자원 생태계를 구축하기보다 미국·유럽과의 협력, 중국과의 안정적 관리, 일본의 대응 전략을 병행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핵심광물은 더 이상 산업 원자재가 아닌 국가 전략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