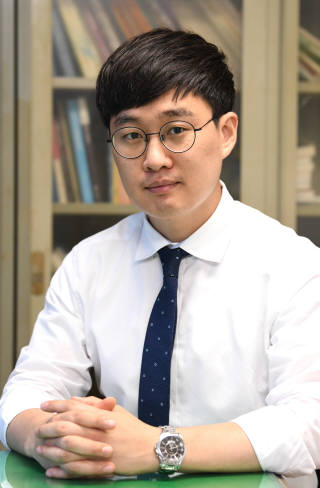
“방송채널프로그램 사용료(이하 PP사용료) 계약이 1년씩 미뤄진 건 잘못된 거래 관행입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뿐만 아니라 정부, 유료방송사도 PP사용료 계약 관행이 비정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 PP사용료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PP 단체의 주장에 반박한 곳은 없었다. 모두가 알지만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
대형마트에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 A가 있다고 가정하자. A는 상품을 꾸준히 납품하고 있지만 본인의 상품 가치를 모른 채 공급한다. 1년 동안 성실하게 납품하면 대형마트가 1년치 대가를 정산한다. 뒤늦게 대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A는 기대보다 대가가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상 거래라면 물품 공급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 선공급-후계약 체계에선 협상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도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을 위해 금전, 물품, 용역 및 기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유형의 하나로 보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은 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은 평가 기간을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30일로 규정, 매년 4분기에 유료 방송사와 PP 간 계약을 권고한다.
가이드라인은 법률 구속력은 없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2019년 PP사용료 계약을 끝낸 곳은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극소수다. 유료방송사는 올해 초 끝낸 2018년 PP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연말이 돼서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의 가입자당 송출수수료(CPS) 분쟁 등을 이유로 계약을 미뤄 왔다.
PP사용료는 콘텐츠 투자의 핵심 재원이다. 모두가 콘텐츠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파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계약 관행은 유지하는 상황이다. PP 사업자는 차년도 PP사용료를 가늠할 수 없다면 투자 계획에도 소극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지금이 계약 관행 개선의 적기다. 인수합병(M&A) 추진 기업도 규모의 경제를 이뤄 콘텐츠에 투자하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경쟁하겠다고 천명, 정부 개입의 명분도 충분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유료방송사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물론 M&A 인가 조건 부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