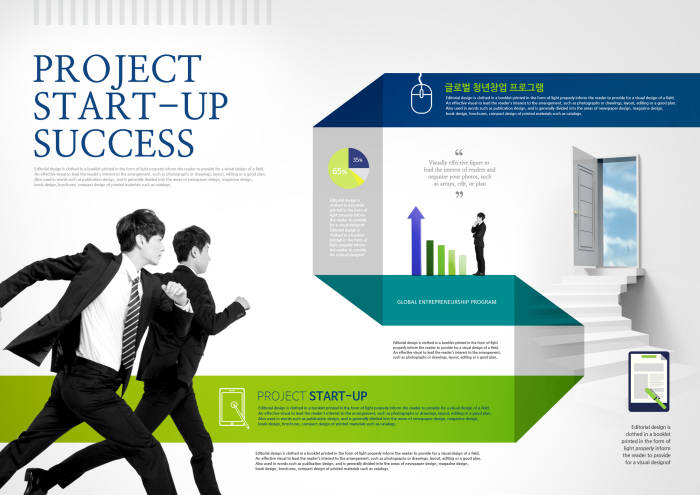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대학생·대학원생 창업은 미국 신성장 동력이 됐다. 미국에선 명문대 나온 청년 중 20~30%는 창업을 택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스탠퍼드대 출신자들이 창업에 뛰어들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우수한 청년이 공무원, 대기업 취업에 몰린다. 이런 결과에는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단순히 국민성 차이로 치부하기엔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창업 생태계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꼽는다. 반도체, 컴퓨터, 전기자동차 등과 각종 소프트웨어를 탄생시킨 실리콘밸리에는 전기전자, 바이오 등 각종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이 밀집돼 있다.
이곳에서 새로운 벤처기업이 끊임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전 세계 기술 트렌드를 주도했다.
물론 실리콘밸리 성공에는 발달한 내수시장, 전 세계에서 집결된 우수한 인재 등 따라잡기 힘든 조건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어느 지역보다 정부 개입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실리콘밸리도 들여다보면 상당한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아낌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보완적인 구조로 스타트업 창업환경을 구성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1년 1월 국정연설에서 `스타트업 육성 활성화 정책(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발표했다. 정부와 민간이 나서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자금 접근성과 재무 부담을 줄이는 데 목표를 뒀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임팩트투자펀드`와 `초기단계투자펀드`를 조성해 5년간 각각 10억달러씩 투자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창업 분위기가 가장 활발한 도시는 광둥성에 소재한 선전(深〃)이다. 2014년 기준으로 선전 인구 100명당 기업(일반 기업, 자영업자, 농민전업합작사 포함)수가 16개에 달해 선전 시민 6명 중 1명이 최고경영자(CEO)다.
중국 창업 열풍 기반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정부 의지가 있었다. 중국 정부는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을 세우고 진입장벽을 허물었다.
회사법 개정을 통해 등록자본금 및 기타 등기 관련 사항을 완화해 창업에 대한 진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아이디어가 좋아도 창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자본금 최소 요건을 폐지하고 출자 방식도 자율화해 `1위안`만 있어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타트업에 도전하기 위한 토양이 발달되지 않았다고 지적받는 한국도 최근 1~2년간 대대적인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창업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민간 주도로 국내외에서 자금이 투자되는 등 합종연횡으로 지원하자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발굴되기 시작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수는 2000년 8798개에서 지난해 3만1260개로 증가했다
융자 풀(pool)을 줄이고 투자 풀을 늘려 창업기업이 쉽게 투자받을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으며 재도전도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했다.

엔젤투자 활성화, 크라우드펀딩 제도화 등으로 창업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털(VC) 규제 장벽도 낮췄다.
중기청에 따르면 △P2P 온라인 대출 등 핀테크 투자 허용 △벤처펀드 통한 지재권 거래 허용 △LP 지분 처분규제 완화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제 완화 △마이크로 VC 도입 △창업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범위 확대 △모태 자펀드 보통주 투자 확대 및 투자기간 장기화 △투자 심사인력 양성 및 외부 유입 확대 등 규제를 개선했다.
또 정부 정책자금을 투입해 청년창업펀드, 여성기업펀드 등 특수목적펀드를 운용한다. 민간 운용사들이 정부 정책펀드에 참여해 청년창업기업이나 여성창업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는 민간투자 활성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팁스는 기술성 평가를 거쳐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집중 육성한다. 민간 투자자가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는 최대 9억원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적은 돈으로 창업기업에 큰돈을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창업 활성화 지원은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중기청은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 규모가 1조668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70%(2015년 기준 6181억원)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실적이다.
엔젤투자 규모도 지난해 1399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엔젤투자는 2013년 566억원, 2014년 834억으로 꾸준한 상승세다.
이와 동시에 창업 플랫폼 다양화, 멘토링 강화, 재도전 환경개선 등 창업 생태계 인프라도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산업은행은 서울 여의도 본점 1층에 `스타트업 IR센터`를 개장해 스타트업 투자유치에 적극 나섰다. 초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기업이 투자자를 만나 다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업설명회(IR)를 여는 공간이다. 센터에서는 매주 IR가 진행돼 연간 스타트업 기업 300여 곳이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는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의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스타트업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스타트업이 선보이는 신규 서비스는 기존에 없던, 혹은 영역을 넘나드는 서비스가 많은데 각종 규제에 걸려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야 운행버스 `콜버스`가 대표 사례다. 콜버스는 택시가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IT를 활용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그러나 콜버스는 택시업체들의 반발로 불법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범 운행을 중단했다가 법인 설립 1년 만에 서비스를 겨우 시작했다.
스타트업 성공은 타이밍에 달려 있다. 아이디어와 혁신성이 핵심인 스타트업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발전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정설이다.
투자를 원활히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시장 선점 및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실제 콜버스는 규제 논란을 겪으며 타이밍을 놓쳐 경쟁력도 잃었다.
자동차 온라인 경매 서비스 `헤이딜러`도 규제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 대표적 사례다.
헤이딜러는 온라인을 기반 자동차 경매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으로 한때 폐업했다가 지난 6월 간신히 서비스를 오픈했다.
정부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하면서 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규제와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처음은 아니다. 직접 현장에서 규제 철폐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