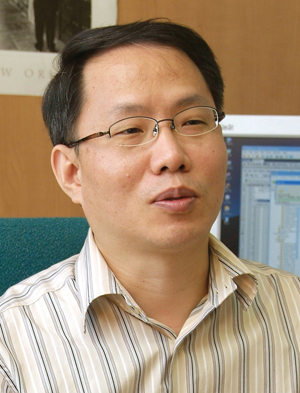
내가 운영하고 있는 디비코는 원래 엔지니어 중심의 영상기기 개발사로 출발했다. 창업공신 대부분이 대기업 또는 영상 전문회사 개발자 출신이었다. 법인 등록 후 우리는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이 결과 영상편집보드, PC TV 카드 등 영상 관련 제품을 국내 대기업보다 한 달 이상 먼저 출시했다. 10여명에 불과한 직원 수를 감안하면 가히 혁명적인 결과였다. 시제품이 나오자마자 용산전자상가 등 오프라인 상점과 인터넷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우수한 기술력 덕분에 판매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시장을 읽는 안목이 부족했다. 소비자 트렌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술만 믿고 너무 앞서 나갔던 것이다. 제품이 안 팔리는데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했다. 2003년 말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창업 5년이 넘었지만 매출이 50억원 수준을 맴돌았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나뿐만 아니라 디비코를 위해 일하는 수백명 직원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기술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초기 실패를 거울삼아 제품 개발 전 과정을 다시 검토했다. 개발 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바로 ‘소비자의 눈’이었다. 이전 실패 경험은 ‘보약’이 돼 돌아왔다. 제품에 무리한 기능을 넣기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을 채택해 가격을 낮췄다. 특히 중소기업으로서는 다소 무리가 따랐지만 제품 원가의 10% 이상을 디자인에 투자했다.
이런 노력은 2004년 이후 점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의욕적으로 출시한 디빅스플레이어 ‘디빅스(TViX)’시리즈가 이른바 대박을 터트린 것이다. 시장 반응이 좋자 매출액도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고 수출에도 탄력이 붙었다. 2005년에는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런 성공을 기반으로 올해는 1000만달러를 거뜬히 넘는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반전이 가능했던 건 어려운 와중에서도 기술 개발을 소흘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품 개발 노하우가 축적돼 있으니 후속 모델 개발 시간도 절반 이상 단축됐다. 다양한 모델 출시는 중소기업인 우리에게 아주 큰 자산이었다. 명품 대접을 받는 ‘티빅스(TViX)’ 시리즈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제 TViX 시리즈는 방송 관련 기술을 접목해 단순한 멀티미디어 플레이어가 아닌 STB PVR로 발전했다.
제품이 뜨니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지만 불안감도 적지 않았다.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리며 화려하게 등장,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업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밑천을 드러내 보이며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경우를 수없이 목도했기 때문이다. 망한 업체는 결국 ‘초심’이 부족했다. 초심을 잃으면 돌아갈 곳이 없다. 중소기업에 초심이란 법인 설립 당시 가졌던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우회로를 택했다. 무분별한 투자를 받기보다는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주력했다. 주위에서는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렸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후회는 없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 경영자의 능력이다. 일부 경영자는 조급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고, 현명한 오너는 느리지만 감당할 수 있는 선택으로 고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 조급한 마음은 오버페이스로 이어진다. 브레이크 없는 오버페이스는 극한 상황에서 이성을 잃게 한다. 리스크에 항시 노출돼 있는 중소·벤처 업체일수록 오버페이스 없는 평정심 유지가 중요하다. 작은 성공에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실패했다고 세상이 끝난 듯이 낙담하는 것은 금물이다.
경쟁사에 앞선 기술은 평정심 유지의 가장 큰 덕목이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에는 ‘독자 기술 보유’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 이런 이유로 중소업체는 먼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갖고 기술개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다소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축적된 기술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향후 ‘제2의 창업’을 만들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한두 해 장사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지웅 디비코 사장 jefflee@dvic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