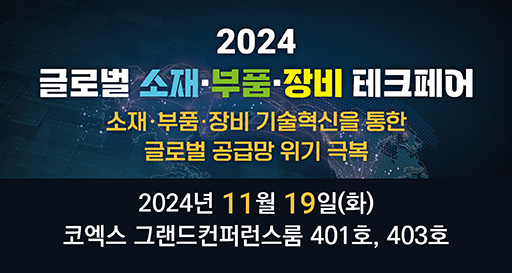전기차 성장 둔화로 세계 이차전지 업계에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배터리 독립의 상징과 같던 노스볼트가 파산 위기에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스웨덴 경제매체인 다겐스 인더스트리,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노스볼트가 재정 위기에 대한 타개책 중 하나로 미국 챕터11 파산보호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노스볼트는 자금 확보를 추진했으나 투자자와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기업회생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노스볼트는 유럽연합(EU)의 지원과 폭스바겐·BMW 등과 공급 계약을 맺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전기차 시대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동안 배터리 양산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전기차 수요까지 줄며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노스볼트에 앞서서는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이 배터리 내재화를 포기한 바 있다. 이 회사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조지아주에 100기가와트시(GWh) 규모 배터리 공장 구축을 준비하고 장비까지 샀지만 올 들어 구매 취소와 함께 있던 장비도 되팔고 나섰다. 이 외 전기차 업체 중 배터리 기술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 받는 테슬라도 전극을 대신 생산할 업체를 찾아 나서 전과는 확실히 다른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배터리 산업은 춘추전국 시대와 같았다. 신생 벤처는 물론 글로벌 완성차 업체까지 전기차 시장 개화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옥석이 가려지고 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연간 50기가와트시(GWh) 이상을 생산할 수 있어야 손익분기점을 넘으며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50GWh는 전기차 약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구조조정이 국내 산업계도 드리우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배터리 관련 회사들도 적자 전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중소·중견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진출한 배터리 셀 분야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노스볼트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배터리는 차세대 수출 품목으로써, 제2의 반도체로 성장이 기대됐다. 국내 산업계도 본격적인 사정권에 들면 가뜩이나 침체된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 자명하다. 충격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