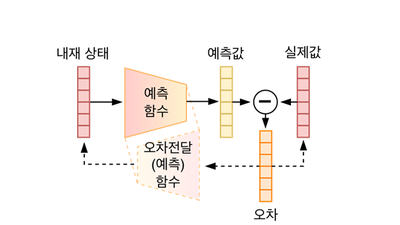올해 노벨상 시즌이 끝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노벨상은 학문의 `사회적 유전`으로 상을 받은 리더급 지도자 밑에서 청출어람으로 수상자가 나오는 추세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새뮤얼슨(1970년대 수상)은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상을 타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어떻게 하면 노벨상을 탈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해 줄 수 있다. 조건 중 하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을 개발한 세계적 뇌과학자 조장희 박사도 스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를 한국에 데려와 정서를 바꾸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도 노벨상은 못 탄다”고 쓴 소리를 했다. 조 박사는 “세계적 성과를 낸 지도자를 국내에 스카우트해 그 아래에서 포스닥 등을 키워야한다”며 “그렇게 배우고 정보를 교환해야 노벨상을 타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문에서 성과를 내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다. 학자의 멘토는 대체로 대학 지도교수인 경우가 많다.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노벨과학상 수상 트렌드`를 살펴보면 노벨상 수상에서 스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료에 따르면 1901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 내 노벨상 수상자 92명 중 반 이상(48명)은 노벨수상자와 대학원생, 박사 후 연수생(포스닥), 연구원(Junior collaborators)의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
미국의 10명 노벨상 수상자가 총 30명의 제자 수상자를 배출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례도 있다. 인공 방사능 물질을 만든 엔리코 페르미(1938년 수상)는 6명의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했다. 어니스트 로렌스(1939년)와 닐스 보어(1922년)는 각각 4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길러냈다. 네른스트(1920년)와 마이어호프(1922년)는 3명, 라비(1944년), 슈뢰딩거(1933년), 디바이(1936년), 엔더스(1954년) 등은 각각 2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교육시켰다. 캐번디시 연구소의 톰슨과 어니스트 러더퍼드(1908년)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총 17명의 제자를 노벨과학상 수상자로 배출시켰다.
미국 노벨상 수상자들이 길러낸 유럽 수상자들까지 포함시키면 사제지간의 연결고리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다. 오토 바르부르크(1931년)는 조지 월드(1967년)의 스승이다. 또 오토 바르부르크는 헝가리의 얼베르트 쇤트죄르(1937년), 영국의 그레이브(1953년), 스웨덴의 테오렐(1955년)의 스승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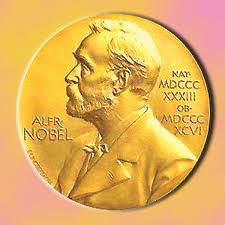
스승과 제자가 5대를 걸쳐 수상한 경우도 있다. 화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인 빌헬름 오스트발트(1909년)는 독일의 물리화학자인 발터 네른스트(1920년)를 가르쳤다. 발터 네른스트는 미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물리학자 로버트 밀리컨(1923년)을 지도했다. 또 로버트 밀리컨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 재임하면서 칼 앤더슨(1936년)을 지도했고, 칼 앤더슨은 도널드 글레이저(1960년)를 가르쳤다. 5대를 넘은 노벨상 수상 계보가 사제 간에 50년 동안 진행됐던 것이다.
실제 노벨상 수상자가 스승이라면 그 제자들은 노벨상을 받는 경쟁 시스템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자신의 뛰어난 제자를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제자들의 연구결과를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자신의 제자가 노벨상을 받도록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러더포드는 중성자 발견과 관련한 물리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과정에서 제자인 제임스 채드윅이 단일 지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바도 있었다. 매년 노벨상 후보는 1000여명에 이르는데 이 때 이전 수상자들이 자신의 제자를 지지하고 유력후보로 지명한다면 서류심사를 통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학부생으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는 프랑스 파리고등사범학교와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 대학교라고 소개했다. 소수의 학생들에게 학교의 독자적 프로그램으로 학문의 관점과 트레이닝을 제공한 것이 노벨상 수상에 좋은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재단은 “사제 간 상호관계와 그들이 지닌 탁월한 안목이 후일 노벨상을 받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조장희 박사는 “노벨상은 서로 추천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구자들끼리 알고 네트워크를 쌓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연결고리 없이 노벨상을 타기는 어렵다”며 “세계적 석학 밑에서 세상 트렌드를 읽고 첨단 연구를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