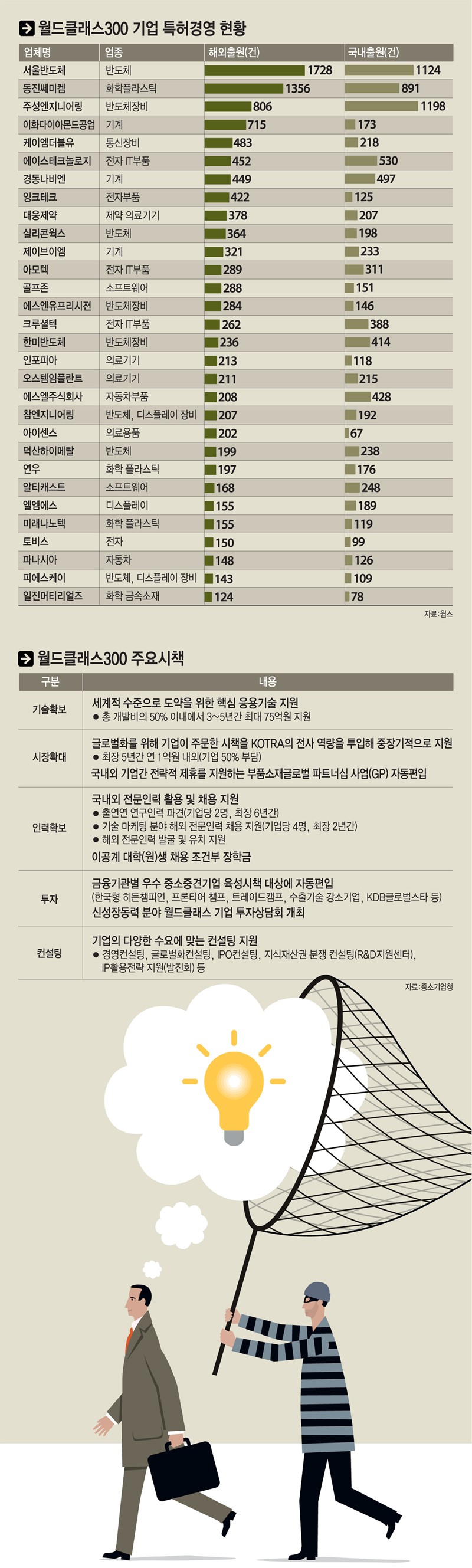
독일 1300여곳의 ‘미텔슈탄트’. 즉 중소기업은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10곳 중 7곳 이상이 사업 초기부터 확보해 세계 시장 개척을 목표로 움직인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독일에서 미켈슈탄트라는 개념을 처음 주창한 인물로 지난 7월 방한한 헤르만 지몬 교수는 “한국의 중소기업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글로벌 시장 개척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축적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려면 ‘특허’라는 보호막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R&D 결과물이 특허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독일 히든챔피언의 경우 전문화된 틈새시장을 개척해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특허를 다수 출원하는 구조다. 지금의 보쉬, 다임러 등이 숙련기능인의 특허를 발판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독일 히든챔피언은 중소중견기업이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6%, 수출 비중은 62% 정도다. 한국 기업의 전체 R&D 투자 비중은 6.7%로 독일보다 높지만 중소기업(1.13%), 중견기업(1.40%)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또 그들은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표준화 같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기준 독일 전역에는 327개의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돼 기업 상호간 협력과 개방형 혁신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아울러 인력이탈이 적은 문화와 환경이 마련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요소다. 독일 히든챔피언은 대기업 대비 80~90% 수준의 임금과 ‘마이스터’로 불리는 고숙련 기술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깊게 안착돼 있다. 이들 기업의 재직자 평균 근속기간은 37년이며 이직률은 2.7%에 그친다. 한국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은 10년 8개월로 이직률은 15.1%에 달한다. 고급인력 수혈과 이직을 막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독일 히든챔피언의 선정 기준은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안에 들거나 소속대륙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해야 한다. 매출액은 50억유로 이하여야 하고 대중의 인지도가 낮아야 한다. 종업원은 500명 미만이어야 한다.
헤르만 지몬 교수는 미텔슈탄트에서 성장한 히든챔피언 절반이 독일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이 독일 경제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히든챔피언은 지난 2009년 전후로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고성장 저실업’ 상태의 유럽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독일은 GDP 대비 6.5%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와 지난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실질실업률인 6.2%를 기록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