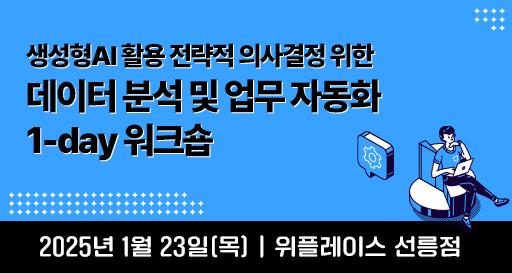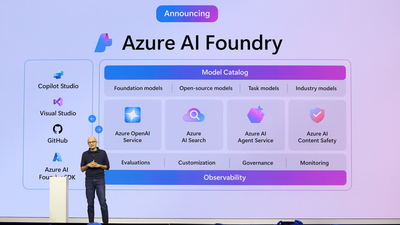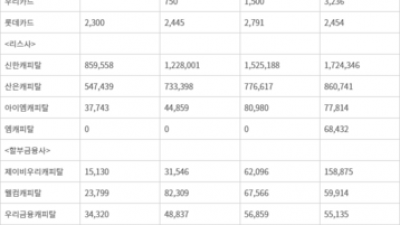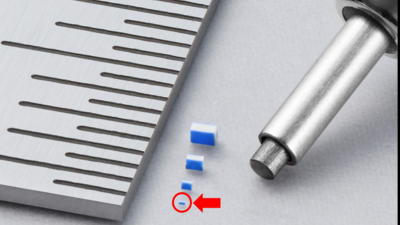이번에 SK텔레콤(이하 SKT)이 발표한 ‘가족 할인’과 ‘망내 할인 확대’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요금 경쟁을 촉발할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두 요금제를 골자로 한 새 요금할인 제도로 인해 SKT의 400만여명(SKT 예상) 고객은 연내 최소 10%에서 최대 25%까지 통신비가 인하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SKT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제도로 연간 3500억원가량을, 올 1월 인하한 SMS 요금까지 포함하면 올해 5100억원가량이 절감된다. 그런데도 경쟁사들은 SKT의 이번 요금제야말로 ‘시장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SKT가 요금 인하를 앞세워 오히려 기존 가입자를 묶고 새 가입자를 확보하는 양동 전략을 구사, 시장 고착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장기고객 타깃은 인하 아닌 ‘할인’제도일 뿐=SKT의 이번 정책의 키워드는 ‘기간’과 ‘할인’으로 압축할 수 있다. 즉 그간 ‘월 사용 금액 정도’를 기준으로 지원되던 통신사의 소비자 정책(주로 보조금)이 앞으로는 ‘장기 고객’ 중심으로 바뀐다는 의미다.
SKT의 새로운 요금제는 실제로 ‘특정 조건(장기간)에 만족하는 고객만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메시지다. 모든 고객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면 소폭이라 할지라도 가입비나 기본료를 일괄 인하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는 고정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에 통신사가 끝까지 반발하는 이유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 유지는 물론이고 새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는 양동작전으로써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배준동 SKT 마케팅부문장은 “전 세계적으로 통신사업자가 기본료나 가입비를 일괄 인하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이번 정책이야말로 창의적인 요금상품 경쟁으로 고객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2200만, 적극 활용 전략=SKT가 이 같은 요금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데는 무엇보다 현 가입자 수 2200만명, 즉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조건 때문이다. 추가 할인 폭이 30%까지 늘어난 망내 할인 제도를 예로 들면 SKT의 현재 망내 할인 가입자 수는 170만명이다. 이 수는 SKT조차 기대하지 않은 결과로 전체 망내 할인 이용 고객의 60%를 넘는 수치다.
이론적으로 망내 무료 통화를 제공하고 있는 LG텔레콤에 대한 호응이 높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유는 고객 한 명이 통화할 때 상대방 둘 중 하나가 SKT 고객이기 때문이다. LGT가 무료 통화를 제공해도 통화 대상의 절반이 SKT 고객인 상황이라면 LGT의 망내 무료 통화는 무용지물이다. 특히, 이 할인 제도 역시 2∼10년 이상 오래 사용한 고객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2200만명의 가입자를 최장 2년 이상의 장기 고객으로 유지하겠다는 전략과 다르지 않다.
◇MVNO 도입 전 고객 붙잡자=SKT의 이번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조만간 등장할 MVNO 제도 도입 등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환경 체제로 전환하기 전 가입자를 최대한 묶어두기 위한 복선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즉, 최대 50%까지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1가구 내 4∼5인의 가족이 SK텔레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최대 80%까지 망내 할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10년 이상 이용해야 한다. 모두 사업자를 바꾼다면 포기해야 하는 혜택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MVNO 사업자가 전환하는 고객에 비슷한 정도의 요금 인하 효과를 주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없다.
이에 대해 이순건 SKT 마케팅기획본부장은 “구체적인 MVNO 제도의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다”며 “다만 MVNO가 도입되면 시장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경쟁 규칙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