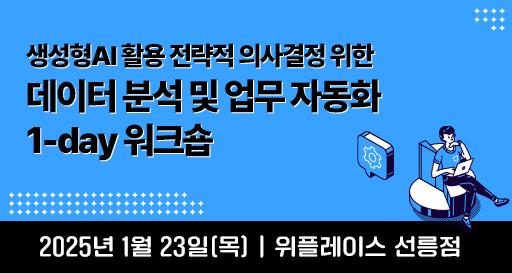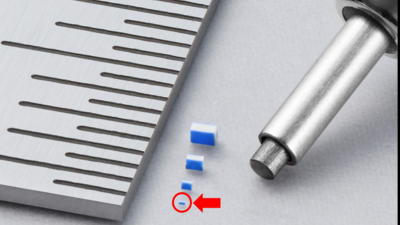정보화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효율적 예산 집행과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마련된 사전 규격 공고제도가 요식적 행위에 그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우선협상제도 또한 발주 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한 최적의 프로젝트 수행 방안 도출’이라는 당초 의도와 달리 사업자 입지를 축소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스템통합(SI) 업계는 사전 규격 공고제도와 우선협상제도가 발주 기관의 ‘전시 행정’ 수단에 불과한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3파전 경합 끝에 중앙부처 프로젝트를 수주, 우선협상에 착수한 A업체는 발주 기관의 황당한 요구에 다시 한 번 우선협상제도의 한계를 실감했다. A업체 고위관계자는 “발주 기관이 3개 업체의 제안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협상 가격으로 제시했다”며 “사업자 간 기술 경쟁을 유도한다는 발주기관의 당초 주장은 궤변과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갑론을박 끝에 A업체는 적정(?) 수준에서 최종 계약을 했지만 SI 업계는 우선협상 과정에서 당초 제안가격을 기초로 최종 계약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입찰제안요청서(RFP)에 의해 규정된 과업 내용 변경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발주 기관이 일단 제안된 가장 낮은 가격을 협상 카드로 내밀기 일쑤라는 것이다.
사전 규격 공고제도 또한 제 역할을 못하기는 우선협상제도와 마찬가지다. 중앙부처 산하기관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규격 공고를 진행했지만 사업 수주를 준비해 온 사업자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사전 규격 공고 이후 관련 업계가 제시된 내용 자체가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기,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등 편파 시비를 일으켰지만 발주 기관이 사전 규격 공고를 토대로 작성한 RFP에는 업계의 이 같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정부부처 산하기관 정보화 사업의 경우에 사전 규격 공고 내용에 불만을 품은 사업자가 사업 참여를 거부, 3∼4 차례 유찰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SI 업계는 이처럼 반복되는 발주 기관의 구태에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 속내를 드러내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다. SI 업계는 과거 잘못된 SI 수주 관행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공감하고 있지만 발주 기관의 전근대적 사고 및 행태가 여전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반면 발주 기관은 사전 규격 공고제도를 악용, 명백한 함량 미달 사업자가 연합해 각종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집단 행동을 불사하는 등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우선협상 또한 당초 예정 기간을 넘겨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계약 이후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발주 기관과 사업자 간 의견이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지적이다. 건전한 시장 질서 구현과 합리적 의견 수렴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구호만 난무할 뿐, 발주 기관과 사업자 모두 특단의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자칫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만 고조되고 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NHN클라우드, 클라우드 자격증 내놨다···시장 주도권 경쟁 가열
-
2
美 퀄컴에서 CDMA 기술료 1억 달러 받아낸 정선종 前 ETRI 원장 별세
-
3
정부, “올해가 공공 AI 전면 도입 원년”…공공 AX 종합대책도 수립
-
4
공공 최대 규모 사업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ISMP부터 착수
-
5
[이슈플러스]'단순하지만 강력'…크리덴셜 스터핑에 계속 뚫리는 보안
-
6
지난해 공공 SaaS 솔루션 계약 규모, 전년 대비 2배 성장
-
7
[ET시선]토종 클라우드 업계, 위기는 곧 기회
-
8
엔비디아·구글·AWS·다쏘 등 빅테크 기업 '천안 스마트 도시 조성'에 힘 보탠다
-
9
신한DS, 120억 차세대 외자시스템 개발 사업 수주
-
10
정부, 460억원 투입해 AI 분야 최고급 인재 양성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