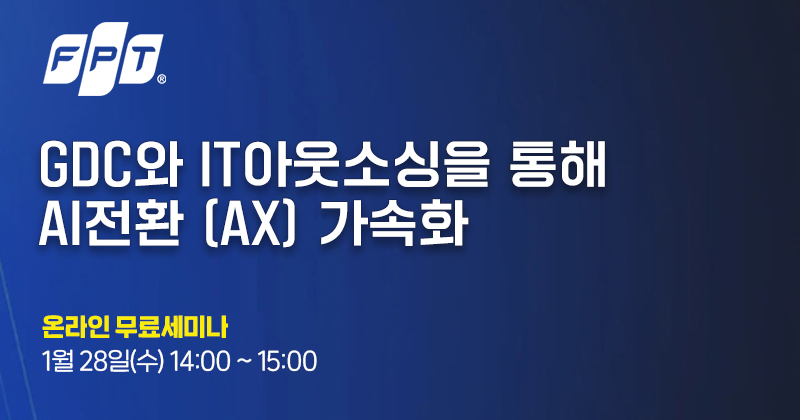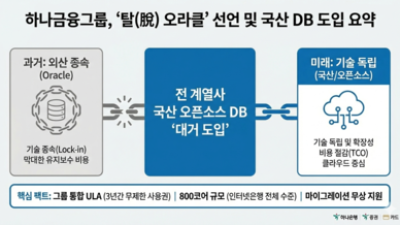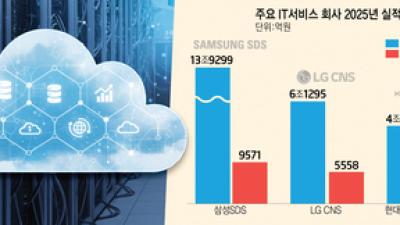정치는 기본적으로 언어의 싸움이다. 몇 단어로 긍정적인 프레이밍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다. '민법 제 1004조의2 개정안'이라고 하면 와닿지 않지만 '구하라법'이라고 하면 누구나 법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노조법으로 언급할지, 아니면 '노란봉투법'으로 표현할지 역시 비슷한 선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은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거나 의도를 숨기기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은 굳이 숨은 의도를 희석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힘을 쏟는다.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 지형 탓이다.
한쪽은 '내란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내란 세력으로 지칭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비율은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40%가 넘는다. 반대로 '1찍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상대방 진영을 향해 쏟아냈던 그 공격은 이제 내부로 표적을 돌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박'과 '배신자'가 바로 그것이다. 수박과 배신자가 멸칭으로 사용되면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당의 운영도 사실상 망가졌다. 의견이 다르면 수박이고 반대하면 배신자가 된다. 전체 국민을 설득하는 대신 그 일부인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당내에서도 공격적인 언어를 활용한다. 옳고 그름과 호불호의 문제도 구분되지 않고 겹친 지 오래다.
정치인은 나보다는 정당을 위해, 정당보다는 나라와 국민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영달과 욕망을 위해 지지층만을 자극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대전환 시대를 앞둔 대한민국 운명은 풍전등화인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정치는 여전히 삼류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