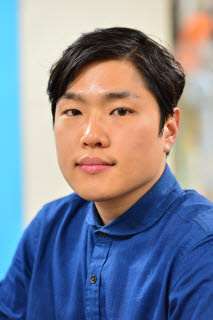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를 목표로 비대면진료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미 관련 법률 여러 건이 국회에 제출됐고 지난달 국회 토론회 등으로 여론 수렴도 시작됐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입법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 단계를 낮추는 등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기 때문에 서비스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다.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혼란을 줄이고 연착륙도 가능하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안은 비대면진료 대상을 △감염병 △만성질환자 △격오지 환자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다. 의사협회 등은 진료 형태도 재진과 의원급 1차 의료기관에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재진만 허용한다면 마약류 등 오남용이 예상되는 처방 이외 모두 허용하는 현재 서비스와 큰 차이가 있다. 현재 비대면진료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아과 진료 등 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다.
상급병원 비대면진료 역시 입원, 수술, 처치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해야 의료서비스 편의와 효율을 넓힐 수 있다. 또 비대면진료에 제한이 가했을 때 지방 의료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꿀 수단으로서 가능할지 검토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완성도를 결정하는 약 배달 문제도 약사회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적절한 합의와 법적 근거 없이 입법이 강행되면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오프라인에서 수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반쪽짜리 서비스가 되는 건 자명하다.
이는 기우가 아니다. 우리는 앞서 '타다 사태'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기득권 이익 충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피해와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정부는 과감하게 논의 대상과 폭을 열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가장 진보된 형태 비대면진료 모델이 안착하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시간에 쫓겨 현실적으로 타협이 가능한 선에서 입법이나 갈등 조정이 이뤄진다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 손해는 시민들이 입는다. 일단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제도를 손볼 수도 있겠지만 고착화한 관념과 생태계를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국내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지 20년째다. 제도화 이후 업그레이드를 위해 또 수십 년을 의견 수렴과 이익 조정에 허비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미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사실상 제한 없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비대면진료와 필연적으로 연결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클라우드, 보안, 인공지능 등 기존 산업 플레이어들이 이미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산업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이곳에서 파생하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어떤 일이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또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타협도 때로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이해관계자 모두 왜 비대면진료를 추진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큰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