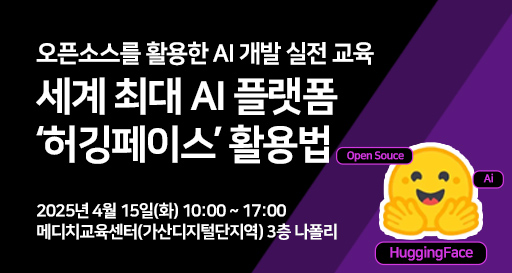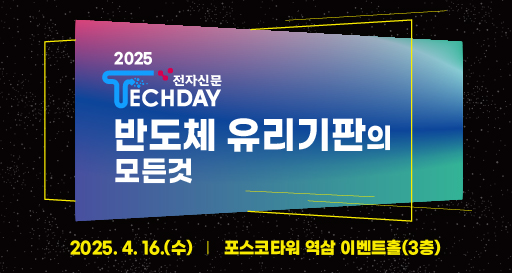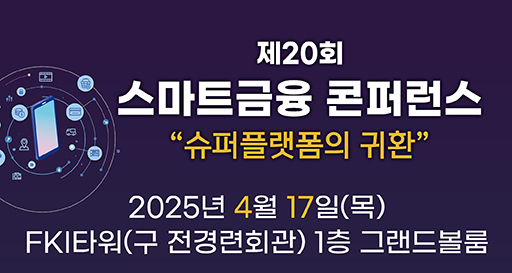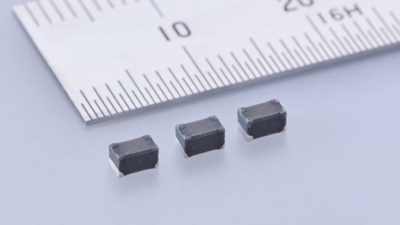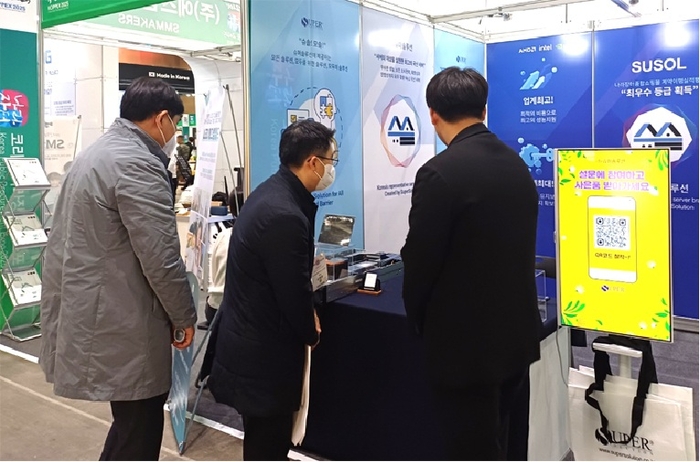휴대폰 판매점이 위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대폰 유통 시장이 위축됐다. 소비자는 비대면을 선호하고 있다.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될 때 문전성시를 이루던 집단상가 분위기도 예전만 못하다. 영세 판매점 가운데 폐업을 택하는 곳도 적지 않다.
반면에 온라인에서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이른바 '성지'는 대성황이다.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전담 조직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전국 단위로 기업화·조직화하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덩치가 커진 만큼 과태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사전승낙이 철회되더라도 명의를 바꿔 불법 영업을 반복한다.
문제는 이통사 자율정화 정책과 정부의 불법 지원금 단속 방식이 과거 오프라인 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으로 거점을 옮긴 성지에 대한 제재 실효성은 낮은 반면에 법규를 준수하며 정상 영업을 하는 판매점에는 부담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불법 지원금 과열 경쟁 정황이 포착된 지역 전체에 내려지는 '시장 안정화'가 대표적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불법 영업이 흔히 자행되던 시절에 해당 지역의 판매 장려금을 일시적으로 축소하면서 신속하게 제동을 걸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온라인 성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골목상권 휴대폰 판매점만 영업 활동을 제약받는 실정이다. 장려금 축소를 넘어 안정화 기간에 휴대폰 판매 실적을 환수하는 '마이너스 정책'까지 등장하면서 출근과 동시에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는 일도 잦다.
불법 지원금 단속 방식에도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 불법 영업의 핵심 창구로 활용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메신저, 밴드 등에 대한 플랫폼 차원의 근절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제재 실효성 제고도 요구된다.
휴대폰 판매 종사자 역시 자정 노력과 함께 정보 공유를 통해 시장 질서 회복에 협력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영세 판매점에는 활로가, 불법 영업에는 효과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