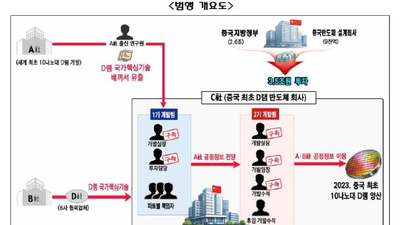정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는 것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 위상을 지켜오고 있지만 미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우려는 중국 추격이다. 중국은 2015년 제조업 육성 방안을 담은 '중국제조 2025'을 통해 반도체 자급률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는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입을 시도해 직접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칭화유니그룹 자회사인 YMTC는 2016년 우한에 240억달러(약 27조원)를 투자해 착공한 낸드 공장에서 2018년 32단 3D 낸드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올해부터 64단 낸드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노트론은 D램 생산공장을 2016년에 착공, 현재 32㎚급 이하 D램을 개발 중이다. 푸젠진화는 소송 등의 영향으로 최근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D램 진출을 준비해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최근까지 막대한 자금력으로 국내 반도체 부품·소재·장비 기업과 인수합병을 시도하거나 고급 기술·연구인력을 영입하는 등 거세게 추격해왔다”면서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은 시간 문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후발주자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넘볼 수 없게 차이를 만드는 것, 바로 '초격차'다.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최적 시기, 최적 위치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다. 반도체 연구개발 능력 지속 향상과 반도체 시설 규모를 확대해 '규모의 경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 후보지로 부상했다. 우수 인재가 근무할 수 있는 곳, 연구개발과 생산시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지역, 또 전기·용수 등 인프라가 갖춰져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점 등이 종합 고려된 결과다.
반도체는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인 동시에 대규모 설비가 수반돼야 하는 장치 산업이다. 막대한 투자로 신규 라인을 건설하며 생산성을 높여야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양대산맥인 삼성전자는 아직 신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여유 부지가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아니다. 이 회사는 2020년 완공을 목표하는 이천 M16 공장을 끝으로 가용 부지가 더 이상 없다. 청주도 지난 10월 준공된 낸드플래시 공장 M15를 마지막으로 가득 찼다. SK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부지 확보에 나선 이유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적기를 놓칠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015년 이천본사에 준공한 M14도 각종 규제에 막혀 공장 증설 신청 이후 완성까지 7년이 걸렸다.
정부는 SK하이닉스가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반도체 산업 전체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담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구상했다. 클러스터에 5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 입주시켜 시너지를 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도 끌어올리는 복안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외산 장비 및 소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오랜 숙제였다. 장비는 80%, 소재는 50%에 달한다. 후발국의 장비·소재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으면 제조기술은 쉽게 추월당할 수 있어 소재, 장비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됐다.
(자료: 업계 종합)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