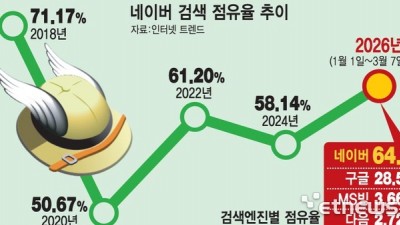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돼도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다. 최신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뜨뜨미지근 하다. 유통점에선 이같은 현상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 목소리다.
3월 갤럭시S9에 이어 18일 LG G7씽큐가 출시됐지만 유통점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갤럭시S9·LG G7 씽큐 모두 예약판매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소비자는 개통을 망설이고 있다.
이통사와 유통점은 보조금에 가려져 있던 민낯이 드러난 결과라고 풀이했다.
소비자는 과거 수십만원대 보조금을 받고, 저렴하게(?)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보조금 대란으로 공짜폰 혹은 페이백이 횡행했다. 수요가 일시에 몰리는 게 다반사였다. 이같은 현상은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반복됐다.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뜨거운 반응으로 포장됐고, 마치 사실인 양 착각했다는 게 이통사와 유통점 설명이다. 제조사·이통사 모두 비정상적 시장을 만든 책임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분명한 건 보조금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당장 이통사는 예전처럼 마케팅비를 쏟아 붓지 않는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 압박까지 시달리면서 보조금 정책은 사실상 뒷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되더라도 과거처럼 판매량이 급증하기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변화 흐름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갤럭시S9과 LG G7씽큐는 디자인·기능·성능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 제품 경쟁력은 재론할 필요없다는 말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선 가격보다 제품의 차별성이 중요하고, 가격이 제품 흥행의 핵심 변수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 지는 고민해야 한다. 가격경쟁력이 추가되면 소비자 반응도 달라지지 않을 까 싶다.
물은 99도(℃)까지 꿈쩍도 하지 않다가 100℃가 돼야 끓기 시작한다. 스마트폰 출고가에서 '마지막 1℃'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