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출범이 불발로 끝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모두 허가 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간 중인 26일 후보사업자 대표자와 지분율 3% 이상 주주 대상 청문회도 실시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려면 사업계획서 심사사항 별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3개 후보사업자 모두 자금조달계획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미흡한 것을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을 받았다. 중소기업으로 주주를 구성해 장비 조달과 협력 부문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준비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 85개 주요 시도(인구 기준 92%)에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받았다.

주요 주주 중 일부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신청 시 내용과 상당히 다른 점,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 한 것도 탈락의 이유가 됐다.
세종모바일(61.99점)은 통신사업자로서 전문성은 인정을 받았다. 반면에 서비스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구축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은 상당 기간 로밍으로만 제공한다고 제시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에서도 자금조달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일에 싸여 궁금증을 자아냈던 K모바일은 가장 낮은 59.64점을 받았다. 심사위원은 K모바일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소유구조가 불확실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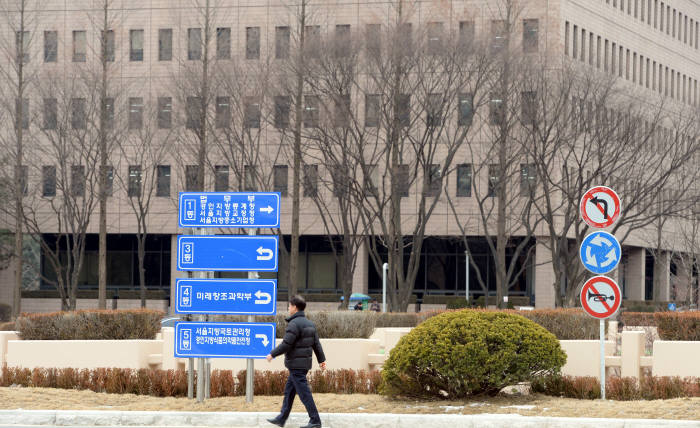
이로써 지난해 6월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년 넘게 진행된 제4이통 선정은 마무리됐다. 제4이통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 체제로 굳어진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을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됐다.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통신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등장으로 소비자 후생도 증대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통신장비업계를 비롯한 통신시장 전반에 온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4이통 출범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 같은 기대는 단순한 기대로 그치게 됐다. 퀀텀모바일과 K모바일이 제시했던 시분할 롱텀 에벌루션(LTE-TDD) 기술의 상용망 도입도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2008년부터 진행된 제4이통 선정이 여러 차례 불발로 그치면서 ‘제4이통 무용론’과 ‘제4이통 불가론’이 팽배해질 전망이다.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됐고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굳이 제4이통 출범을 추진해야 하냐는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1대주주로 참여해야 한다는 심사와 평가 방식의 근본적 변화 요구도 나올 수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전국망을 서비스하는 3개 사업자가 있고 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태라 제4이통 출범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향후 사업자 선정은 시장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4이통 출범 불발로 2.5㎓와 2.6㎓ 모두 주파수 경매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자체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는 ‘풀 MVNO(알뜰폰)’ 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4이통과 알뜰폰은 설비 구축 등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제4이통 선정을 계속 시도할 계획임을 내비췄다.
공종렬 KMI 대표는 “몇 년 동안 안되었는데 다시 한들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냐고 반박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통신시장 발전과 경기진작, 투자활성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4이통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제4이통에 대한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허가신청법인별 심사결과※( )의 수치는 각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임>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