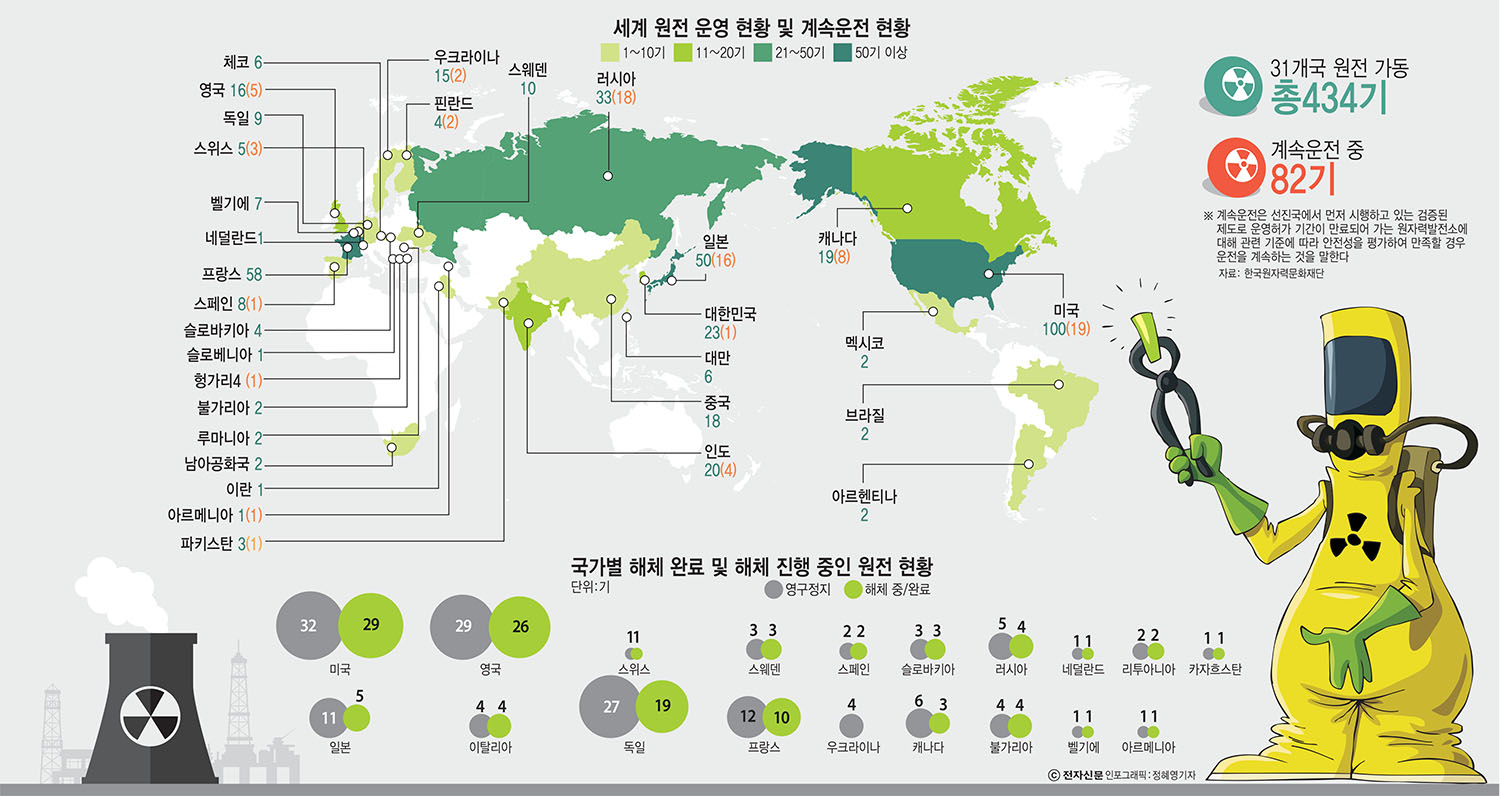
원전 해체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해 산업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원전 해체 시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현실적인 해체 비용 마련, 원전의 안전성 확보, 기술력 확보 등 많은 지적 사항이 언급됐다. 원전을 해체할 경우 56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000억원의 부가가치, 3700여명의 고용 창출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의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원전 해체 준비는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숙제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원전 해체 준비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관련 논란이 탈원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원전 산업에서 각종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원전 해체 필요성을 탈원전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모양새다. 원전 해체 실증사업 주장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계속 운전 이슈에 놓인 원전 철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 개발을 원전 해체로 연결하는 접근이 오히려 정부의 대응을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순히 실증이라는 이유로 아직 안전성과 경제성을 유지하고 있는 설비를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제성을 무시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해체 실증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철거 단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법에 원론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원전 해체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는 것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설계 수명에 대한 인식차도 문제다. 업계는 안전성 수명과 경제성 수명이 혼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계 당시 정한 수명은 설비가 정상적으로 경제성을 낼 수 있는 수준을 설정한 것으로 중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전성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장비를 모두 갈아치운 설비는 안전성과 경제성 수명이 모두 달라지게 된다”며 “최초 설계 당시 수명을 지금에 그대로 끼워 맞추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