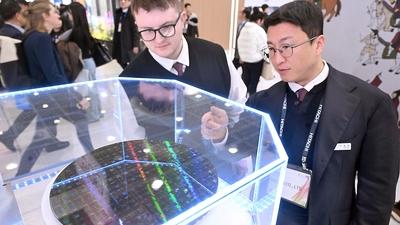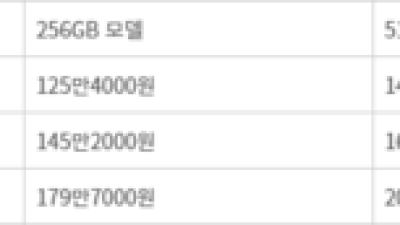통신산업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시끌시끌하다. 정부·시민단체와 제조사가 갈등한다. 정부 내 이견도 보인다. 처음엔 한목소리를 냈던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 틈도 벌어졌다. 이해관계가 이리저리 얽혀 어지럽다.
단말기 보조금은 이통사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단말기 값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 타 사업자로 옮기지 않을 때 주는 `약정 보조금`과 제조사가 판매 진작을 위해 유통업체에 주는 `판매장려금`이 있다. 이 보조금 유통이 혼탁해 각종 폐해를 야기했다. 특히 들쭉날쭉한 보조금은 소비자 차별 문제를 빚었다.
그러자 정부가 보조금 공개와 출고가, 판매장려금, 판매량 등 제조사 자료 제출을 내용으로 한 새 규제를 의원입법으로 내놨다.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야 좋다. 하지만 새 법까지 만들어 강제할 일인지 의문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정공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보조금 경쟁만 골몰하는 것은 요금 경쟁이 없는 탓이다. 요금제 인가 등 정부 규제가 사실상 그 길을 막았다. 요금 경쟁이 안 돼 생긴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다고 요금 경쟁이 이뤄질까. 순진한 생각이다. 이통사가 보조금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은 그 효과뿐만 아니라 요금 인하 경쟁보다 훨씬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도 이통사가 한번 벌이면 걷잡을 수 없는 요금 인하 경쟁에 자발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조금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0년 전면 금지부터 막대한 과징금 부과, 순차 및 개별 영업정지 등 온갖 수를 써도 다 실패하지 않았는가. 급기야 세계 최초로 제조사 규제를 시도한다. `보조금 규제 그랜드 슬램`이라도 도전하는 모양이다.
판매장려금은 잘 팔아달라고 제조사가 유통사에 주는 판촉지원이다. 팔리지 않는 단말기가 나오면 어찌 할 것인가. 재고로 썩힐 수 없으니 결국 새 법안에 예외를 둘 수밖에 없다. 무릇 법에 예외가 많으면 실효성을 상실한다.
해외에서는 요즘 보조금 회의론이 확산됐다. 결국 수익성만 갉아먹는 것임을 깨닫고 폐지하는 이통사가 등장했다. 스페인 텔레포니카, 미국 T모바일, 호주 텔스트라다. 세 이통사는 단말기 할부제, 저렴 요금제 신설, 월별 보너스와 같은 새 가입 유인책을 고안했다. 일시적 가입자 이탈, 매출 감소 우려도 있지만 수익성이 확실히 나아졌다. 다른 이통사도 동참하려 한다. 미국 AT&T와 버라이즌, 영국 보다폰 등 당분간 보조금제를 유지하는 이통사도 데이터요금제 다양화, 단말기 임대 등 새 활로를 찾는다. 보조금 규제가 없어도 사업자 스스로 이렇게 보조금을 없애려 한다. 우리만 시장 원리 작동 없이 오로지 법 규제로만 해결하려 한다.
“이러면 어떨까요. 불법 보조금을 준 이통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기본료 인하를 강제하는 겁니다. 과연 지금처럼 할까요.” 한 전직 고위 관료가 이렇게 되물었다. 신선한 발상이다. 꼭 그의 말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정 보조금을 규제하겠다면 현행 법과 제도 테두리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 정보접근권 확대와 보조금과 요금할인 선택제도 새 법 없이 시행 가능하다. 판매장려금 문제도 불공정 행위로 충분히 현행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세계 통신시장 대세는 보조금이 아닌 요금제 차별화 경쟁이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달라졌다. 당장 싼 단말기로 비싼 약정 요금제를 드느니 제값을 주고 더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통신시장 `손톱 밑 가시`인 보조금 폐해도 시장 원리에 따라 머잖아 축소될 전망이다. 이 때 갑자기 한국에서 새 법이 툭 튀어 나왔다. 엉뚱한 `손톱 밑 대못`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경계할 일이다.
신화수 논설실장 h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