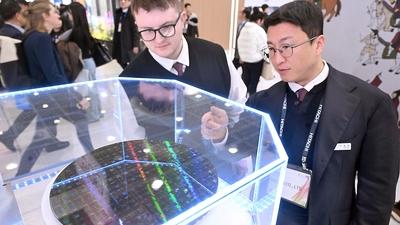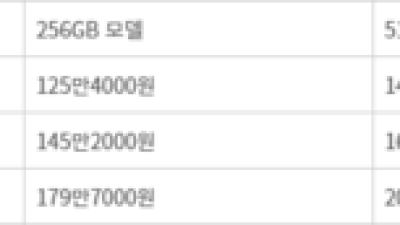통신기술 업계가 뒤숭숭하다. 화웨이가 LG유플러스의 2.6㎓ 주파수 광대역 롱텀에벌루션(LTE) 기지국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된 다음부터다. 중국 기업이 한국 기지국 장비 시장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다.
화웨이가 얼마나 공급할지 미지수다. 이 회사 말고도 삼성전자,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NSN)가 있다. 하지만 화웨이의 가격 경쟁력을 감안하면 공급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탈락한 에릭슨LG의 물량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에릭슨LG를 겨냥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화웨이에게 한국 LTE란 구축사례(레퍼런스) 의미가 막대하다. 그간 LG와 에릭슨LG 간 관계도 불편했다. 안정적 공급에 안주했는지 에릭슨LG가 고압적이라며 늘 못마땅하게 여겼던 LG다. 지난해 지분 축소로 `옐로우 카드`를 보낸 LG가 아예 `레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필 교체 선수가 화웨이다.
충격을 받은 건 에릭슨LG뿐만 아니다. 협력 통신기술업체들은 가뜩이나 준 물량마저 아예 사라질까 전전긍긍한다. 기존 기지국 장비 업체는 리모트라디오헤드(RRH), 부품과 모듈, 소프트웨어 등 장비 구성 절반 이상을 국내 협력사에 맡겼다. 화웨이는 전량 중국 협력사로부터 조달한다.
이것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해외 수출에 직격탄이다. 화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한국 LTE 레퍼런스를 앞세워 다른 나라 차세대 통신시장 공략에 고삐를 죌 것이다. 중국의 화웨이 협력사들엔 새 날개가 생겼다. 우리 통신기술 업체들은 어렵사리 개척한 해외 시장을 송두리째 잃을 위기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통신사업자도, 정책 당국도 전혀 알지 못한다.
LGU+ 선택을 뭐라 꼬집기 어렵다. 장비를 값싸게 주겠다는데 마다할 통신사업자는 없다. 다른 공급사에 인하 압박도 할 수 있다. KT와 SK텔레콤도 이를 주목할 것이다. 그런데 LGU+ 측이 화웨이 장비 도입 재고를 요청한 통신장비업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주파수 경매에 쏟아 부은 비용 때문에 더 저렴한 장비를 살 필요가 있다.” 정책 당국은 주파수경매가 이런 `나비효과`를 낼 줄 과연 상상이라도 했을지 의문이다.
화웨이는 중국 기술기업 성공 신화 그 자체다. 열 명도 되지 않은 구멍가게 대리점으로 시작해 25년 만에 세계 통신장비 업게 정상에 올랐다. 그 파상 공세에 미국 루슨트와 프랑스 알카텔이 합쳤다. 캐나다 노텔은 파산했다. 화웨이가 매출액에서 에릭슨에 근소하게 밀리나 이익률, 성장속도, 기술특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사실상 세계 1위다. 이 회사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미국 정부는 보안을 빌미로 자국 시장 진입을 막았다.
화웨이가 단말기까지 넘본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넘어갔지만 노키아 인수도 한때 검토했다. 어쩌면 노키아와 애플까지 넘은 삼성전자 앞에 나타난 진짜 적수일지 모른다.
중화권에서 시작한 화웨이의 세계 정복 여정은 신흥국을 거쳐 유럽 등 선진국 시장까지 도달했다. LGU+ 공급으로 세계 최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강국에 들어왔다. 오로지 연구개발(R&D)로 이룬 화웨이 성공 신화 자체는 본받을 만하다. 그러나 당장 우리 통신기술 산업계가 초토화할 지경이라 선뜻 박수를 보낼 수 없다. 유선 시장에서 겪었던 화웨이란 `트라우마`가 더 크게 재발할 판이다. 이젠 화웨이란 `트로이 목마` 안에 숨어 어둠만 기다리는 중국 협력사란 병사까지 상대해야 한다. 정말 두렵다. 정부는 50% 이상 한국산 솔루션 채택과 해외 동반 진출 의무화와 같은 비상 대책을 서둘러 강구할 시점이다. 보안 장벽 정도로 막을 상대가 아니다.
신화수 논설실장 h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