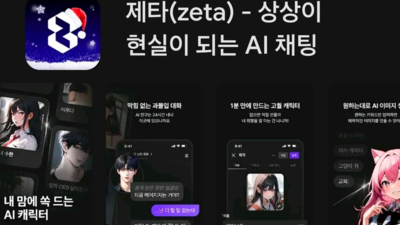“어렵더라도 차라리 내 돈으로 연구개발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얼마전 만난 지역의 한 중소 정보기술(IT) 업계 사장의 말이다. 자금이 부족하면 기업지원기관을 통해 정부과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게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의 말에는 울분과 함께 앞으로는 정부과제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요즘 지역 기업인들이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기업지원기관들이 정부사업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과제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보고 요구를 받는다. 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을 막아 과제가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 감시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 과제사업에 대한 보고는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의무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요구가 감시감독 차원을 넘어 지나치게 많고 시도 때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 기업은 금요일 오후에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월요일 오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여러 번 받았다. 어떤 기업은 매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를 만드느라 다른 일은 할 수도 없다. 미움을 산 특정기업만이 겪는 일이 아니다. 과제사업을 하는 대다수 기업들의 불만이다. 이런 요구에 불응하면 기관의 사업담당자로부터 험악한 말을 들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불응은 꿈도 못 꾼다. 적어도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은 그렇다. 미운털이 박히면 자칫 사업실패로 사업비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다.
지원기관과 기업은 갑(甲)과 을(乙)의 관계가 아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사이다. 굳이 갑을 관계를 따진다면 기업이 갑이어야 한다. 지원기관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고객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지원기관 역할이다. 사업비를 지원해줬으니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정부자금을 받고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은 적절한 감시를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감시가 지나치면 오히려 훼방이다.
이런 분위기가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과제사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낳아선 안 된다.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