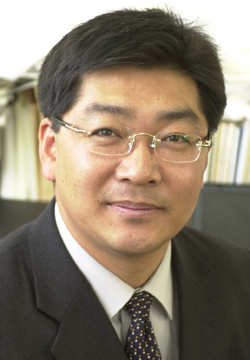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의 산실인 대덕 특구가 1년 중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낸다.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부의 심정인 양 올 한 해 일궈놓은 성과물로 논문, 특허, 기술이전 건수 등을 챙기는 데 여념이 없다. 10월 국감 준비까지 겹친 기관은 정신이 없다.
묘하게도 이 시즌이 지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이직이 잦다. 처우에 대한 자괴감과 때론 좀 더 부유한 삶에 대한 욕구 등으로 인해 새 일을 찾아 떠나는 때가 바로 10, 11월 찬바람이 불 때다. 떠나기 전에 하던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 작용하는가 보다. 출연연에 따라 다르지만, 자발적 이직인 자연 감소분은 연 5∼10%다.
벤처 창업이나 연구소기업 설립, 미뤄둔 공부를 하러 떠나기도 한다. 대학으로 옮기는 이들은 대부분 가족의 등살이 주요인이다. 왜 연구원으로 살면서 고생하느냐는 게 주변의 성화다. 대학교수 정년은 65세다. 연금 혜택도 크다. 출연연만큼 연구환경이 좋지 못해도 사회적 평판이 좋다. 정계 등 다른 곳으로 나갈 기회 또한 상대적으로 많다.
정부출연연은 1970년대 과학입국의 부푼 꿈을 꾸던 시절, ‘옥동자’로 태어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1980년대 중공업 육성에 기여하면서 인정을 받았고, 1990년대엔 연구 성과를 내면서 최고의 직업으로 군림했다. 모두가 IMF라는 직격탄에 구조조정 1순위로 전락하기 전의 이야기다. 이후 출연연이 독일과 일본을 벤치마킹하며 연구회라는 새 틀을 만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거버넌스(지배구조) 체제에 대한 고민을 한다.
산업기술연구회와 다국적컨설팅업체 ADL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거버넌스 개편안이 이달 말에 나온다. 개편 완료 시점은 2011년이다. 개편안을 보면 출연연의 법인통합은 불가피하다. ADL이 참고로 한 벤치마킹 모델은 일본의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와 독일 프라운호퍼, 핀란드의 VTT, 대만 ITRI 등 5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공통점이 단일 통합법인 체제다. 어느 기관을 벤치마킹하든 통합은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보면 오는 11월 선정될 ETRI 기관장은 임기가 1년이다.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은 모두 1년 이하 임기의 기관장을 맞아야 한다.
거버넌스 개편의 목적은 효율성 증대다. 그러나 이 효율성은 시스템 개편만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효율성을 결정한다. 연구원 마음속에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면 어떤 혁신도, 예산 투자도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 취임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옛 경제기획원 재임 시절이던 1992∼1993년 ‘한국의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과 ‘주요국 민영화 사례’ 등을 저술하는 등 공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로 알려졌다. 그래서 다들 두려워한다.
이명박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이달 들어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서민 행보 때문일까? 아니다. 경제가 나아져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기회와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일에 대한 효율이 올라간다면 정부 지지도는 함께 상승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게 출연연에 대한 해법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