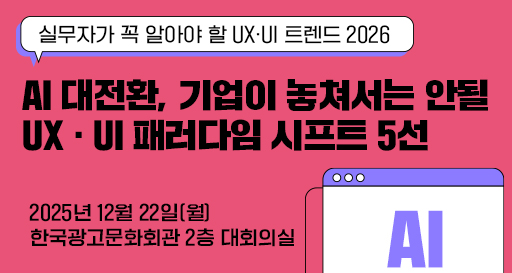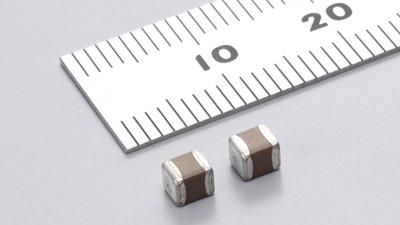지난달 사상 최대의 월간 번호이동을 기록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에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 문제가 또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 말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는 법안이 일몰된 이후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을 통한 경쟁 격화와 축소를 반복했다.
7월 초 방통위는 통신사업자 CEO간담회를 열고 보조금 규모 축소를 협의하는 등 다시 보조금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규제의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보조금 규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4700만명으로 전 국민의 약 96%가 사용하고 있다. 특히 주파수라는 국가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소비재 산업에 비해 공공성이 매우 강하다. 일각에서는 통신기업이 모두 민간기업이고, 보조금은 이러한 기업 간 경쟁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동통신 사업자 중심의 논리지, 공공성이 강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고객관점 논리는 아니다. 보조금 문제로 자주 지적되는 것이 이용자 차별이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전체 고객에게 사용돼야 할 재원이 번호이동을 하거나 신규가입을 하는 등 휴대폰을 교체하는 고객에게만 과도한 혜택으로 제공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이동통신 사업자 간 휴대폰 보조금 외의 본질적인 경쟁 요인을 무력화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의 또 다른 문제는 보조금 경쟁의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 최근 시장상황을 보면 어느 사업자도 보조금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한 사업자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을 댕기면 경쟁적으로 돈이 바닥날 때까지 쏟아붓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방통위의 정책 방향과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행보라 할 수 있다. 이에 두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 명확한 보조금 지급 기준 정립과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 수립이다. 사실, 보조금에는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폰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순기능도 존재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을 합법화하되, 이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 과다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즉, 사업자가 휴대폰 교체 고객만이 아닌 모든 고객에게 혜택이 가는 서비스로 경쟁을 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복잡한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단순화, 슬림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극심한 보조금 경쟁의 배경에는 복잡하고 방대한 유통 구조가 크게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말기를 판매하는 유통점이 전체로 2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점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물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유통으로 흘러가는 막대한 비용이다. 지난 5∼6월에 이통사·제조사가 함께 쏟아부은 돈이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사용된 보조금의 약 40%가 유통 이윤으로 흡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개월간 1조원에 가까운 자원이 이곳으로 흘러간 것이다.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으로 단말기 교체를 자주 하지 않은 대다수 고객이 지급하는 통신요금이 유통 이윤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제 이동통신사업자 간 승부보다 어떻게 경쟁하는지의 시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업의 공공성 관점에서 이동통신 사업자 먼저 자성해야 한다. 국민과 고객 관점에서 질적 경쟁을 해야 한다. 조속히 보조금 법제화, 유통구조 단순화 등 건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김철수 LG텔레콤 부사장 cskim@lgt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