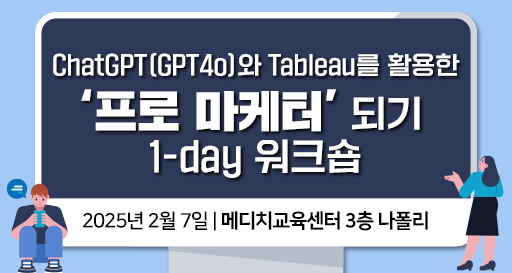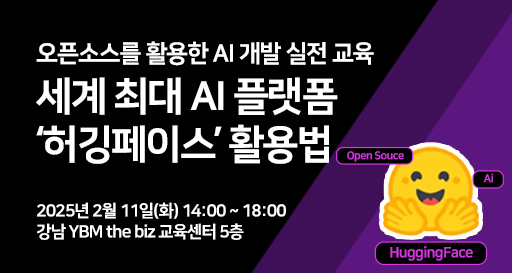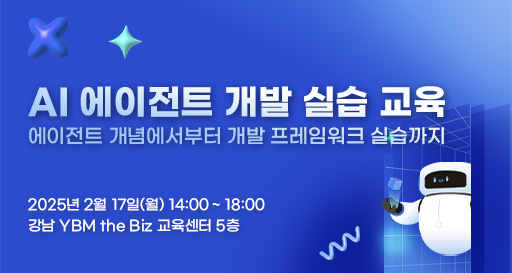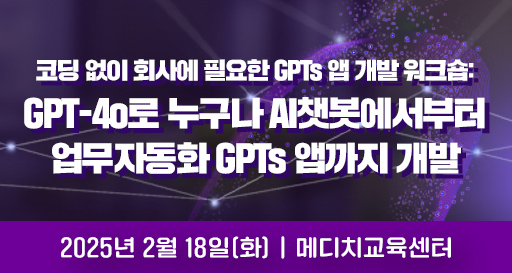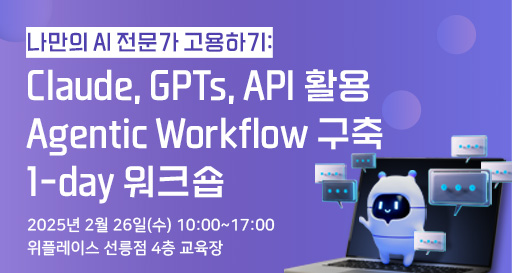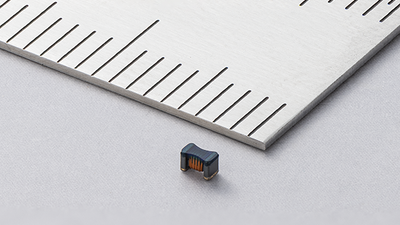지지부진으로 IT산업 활성호 악재로
통신서비스 분류체계 개선이 1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신규 서비스의 도입과 시장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융합서비스의 경우 미비한 법제도로 인해 사업자들마다 혼란을 겪고 있어 침체된 IT산업의 돌파구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말 법제화를 추진한 통신서비스 분류체계 개선안이 사업자간 이해가 상충하고 정부 부처간 업무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연내 법제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VoIP)서비스의 경우 당장 착신번호 부여와 상호접속 허용이 무한정 지연되고 있으며 무선랜·디지털미디어센터(DMC)·위성디지털미디어방송(DMB) 등 차세대 융합서비스 역시 사업자 허가 등의 일정이 순연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통부는 유선과 무선, 음성과 데이터, 통신과 방송의 융합 추세에 대응해 기간과 부가로 구분한 서비스 분류체계를 정보 변형 여부에 따라 전송과 정보서비스로 분류하고 전기통신회선 설비의 보유 유무와 제공서비스에 따라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로 나누는 분류체계 개선안을 지난해 6월 마련,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들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개선안에 대해 합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통부의 개선안을 방송 분야로의 진출로 해석한 방송위원회의 반발로 인해 공청회도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송위원회와도 조율해야 하는 등 개정안을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늦어지고 있다”며 “4분기 안에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화제도전담반의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 작업을 시작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인터넷전화의 역무 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선과 무선, 데이터와 음성으로 나뉘어진 기존 역무체계에서는 사실상 인터넷전화를 명확히 정의내리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방송위원회는 정통부와는 별도로 지상파DMB와 위성DMB 등에 대해서는 기존 지상파사업자와 위성사업자들에 사업권을 주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은 “융합서비스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체계도 잡히고 사업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