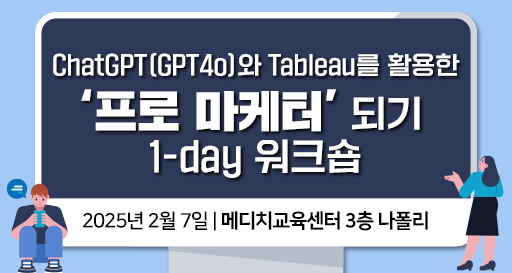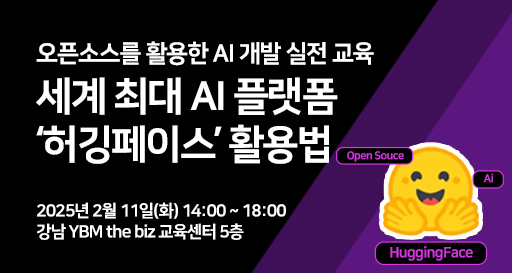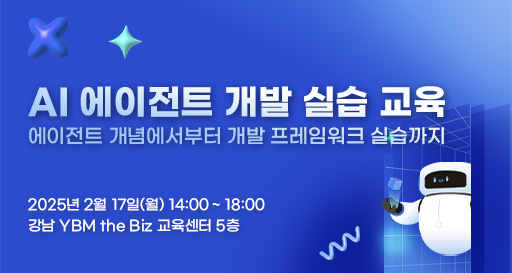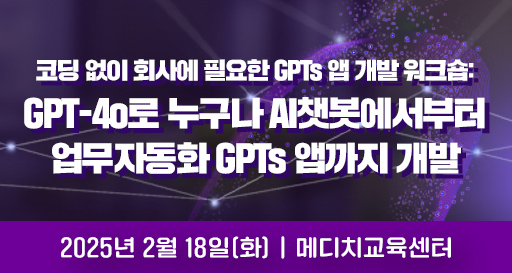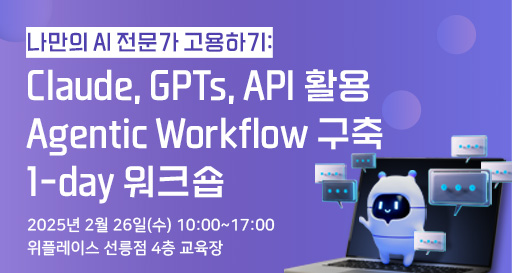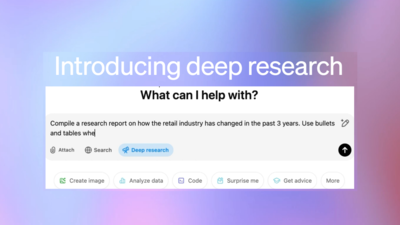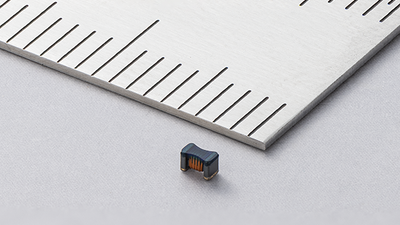◆장수덕 <정보통신지적재산협회 부회장·美변호사 sdjang@itipa.org>
작년 1년 동안 4억대의 이동전화단말기가 팔렸다. 줄잡아 대당 5달러의 로열티를 부담했다고 치자. 어디에선가 20억달러의 로열티가 수수됐으리라. 무선통신단말기만 쳐도 이러한데 IT 전분야를 합하면 또 얼마나 될까. CDMA 지재권 사업을 위주로 하는 퀄컴은 작년 한해 동안 약 20억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IBM은 연간 10억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낸다. TI의 연간 수익의 30%는 로열티 수익이다.
IT강국 대한민국, CDMA종주국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벌고 있나. 벌다니 천만부당, 도리어 매년 수억달러씩 갖다 바치고 있다. 왜, 기술이 없나, 지재권이 없나. 천만에. 우리 CDMA가 퀄컴에 버금가는 것은 퀄컴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며 우리 자신이 자랑한다. 오로지 곡간에 쌓아놓았을 뿐 장터에 내놓고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장하고 값을 매겨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DVD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일본은 기술 보유자들이 합동해 포럼을 만들고, 가진 기술을 총망라하고 포장해서 세상에 내놓고 돈을 내라 했다. 중국이, 그 짠 중국이 당장 1200만달러를 냈다.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값을 찾지 못하나. 이것은 비단 IT분야만이 아니다. BT, 무슨 T, 어느 분야에서도 우리 기술의 값을 찾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입국을 주창하고 수십년간 국부의 상당 부분을 기술개발에 투입해 왔다. 국가가 개발한 기술을 축적하는 데에만 열중했지 이것을 널리 상용화하고 기술을 바탕으로 지적재산을 확보하며 이를 자산으로 사업화해 투자한 연구비를 회수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해마다 국책연구기관에 지원되는 거대한 연구비는 한 방향으로 쓰기만 했지 회수되지는 않았다. 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연구해 바칠 뿐 연구결과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한다. 연구기관들은 사기업이 아니니까 돈을 버는 사업은 본업이 아니라 큰 관심이 없었다. 첨단 기술의 보고는 연구기관이지만 사기업들은 연구기관의 지재권을 사업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지적재산을 사업화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에는 국익을 위해 이러한 지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명분도 권한도 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을 관장할 수 있는 정부기관도 있다. 기술입국과 기술자 복지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도 있고, 산업을 일으키고 자원을 관리하고 특히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자산화하는 것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도 있으며, IT강국을 주도하는 정보통신부도 있다. 이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도 물론 있다.
똑같은 성분을 가졌지만 물이 물로 사용됐을 때와 얼어서 얼음으로 사용됐을 때와는 그 용도가 다르고 돈을 버는 능력도 엄청나게 다르다. 우리는 기술의 용도를 안다. 기술을 가지고 제조도 하고 기술을 상업화해 기술료도 받는다. 그러나 기술을 지적재산권으로 바꾸고 형태가 달라진 지재권을 소재로 해 따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사업화하고 사업을 많이 해서 국가 산업화까지 가면 그 용도가 다르고 돈을 버는 능력 또한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물을 얼려 얼음으로 바꾸어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빙수도 만들어 파는 것과 다를 것 없는 지재권 장사를 유독 우리만 할 줄 모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원래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형체가 없는 것을 거래할 줄 몰랐다. 서양 사람들은 미래에 생길 권리도 사전에 거래할 줄 알았고, 우리가 봉이 김선달 같은 얘기로 천하게 여기는 사이 일찍부터 이러한 게임을 정당한 관행으로 해온 것이다.
이제 세계화되는 세상에서 우리도 서양게임 한번 해보자. 그리하여 말로만 IT강국이 아니라 명실공히 세계의 IT선도국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마땅히 찾아야 할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IT분야의 국제경쟁력이 가장 강하므로 먼저 이 분야에서 지재권 라이선스 제도를 구축해 운용하면 그 성공사례가 곧 BT 등 타 분야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시선]HBM에 가려진 한국 반도체 위기
-
2
[김태형의 혁신의기술] 〈22〉혁신의 기술 시대를 여는 서막(하)
-
3
[전문가기고]습지, 우리 미래를 위한 핵심 생태계
-
4
[인사]서울경제신문
-
5
[ET단상] 트럼프 2기 '플랫폼 국가'의 약진
-
6
[박영락의 디지털 소통] 〈20〉지역관광 SNS,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활용
-
7
[부음]김준하(삼성전자 MX사업부 디자이너)씨 부친상
-
8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35〉 [AC협회장 주간록45] 스타트업 전략과 손자병법의 오사칠계
-
9
[김경진의 디지털 트렌드] 〈21〉고객 세그먼트 분석 방법
-
10
[사이언스온고지신]AI와 샌드박스, 글로벌 샌드박스 출범의 의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