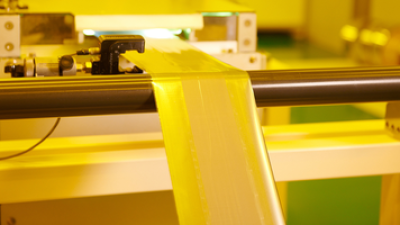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팹)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 유예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 숨통이 트였다. 고조되는 미·중 반도체 갈등에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으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생산 능력 확대에 제한을 받는 '가드레일' 등 미·중 갈등에 따른 영향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세밀한 전략과 균형이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9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팹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국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한지 1년만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 유예를 받는데, 이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로 전환한 것이다.
이같은 조처는 기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전 승인된 기업,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이같은 결정을 미 정부로부터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팹 운영 최대 변수를 상수로 바꾼 계기로 평가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생산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중국 팹 운영이 불가하다고 우려해왔다. 18나노(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첨단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미국산 장비가 없으면 18나노 이하 D램이나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하지 못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뜩이나 적게는 20%, 많게는 40%에 달하는 생산설비를 중국 내 구축해놔 반도체 장비 반입이 가로막히면 치명타를 입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불확실성 해소에 일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각국 정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유예 연장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128단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0나노 안팎의 D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들 공정을 200단이나 10나노 등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그동안 중국 반도체 업체들과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신 공정 도입을 위한 장비 반입을 요구해왔는데, 이 희망이 현실화된 것이다.
다만 중국 내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두고볼 문제다. 일부 장비 업그레이드로 시장 수요에 대응한 제품 전환, 고도화 등은 가능하지만 생산 능력 확대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등 우려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키우는 걸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최근 확정했다.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28나노 미만 시스템 반도체(로직) 경우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10년 간 5% 이상 생산능력을 키우지 못한다. 가령 이번 장비 통제 유예로 낸드 플래시 경우 128단 이상 제품을 생산할 장비를 반입하더라도 생산 물량 자체를 크게 늘리지 못한다는 의미다. 또 초미세 회로를 그리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도입도 여전히 제한된 상태다. 여기에 미중 반도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업 입장에서 전과 같은 투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 능력 확대가 어려운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진 못할 것”이라며 “현재 반도체 시황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 활동 자체가 제한 받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