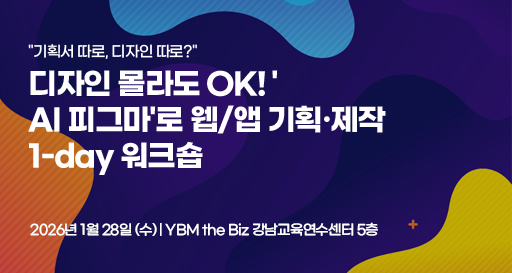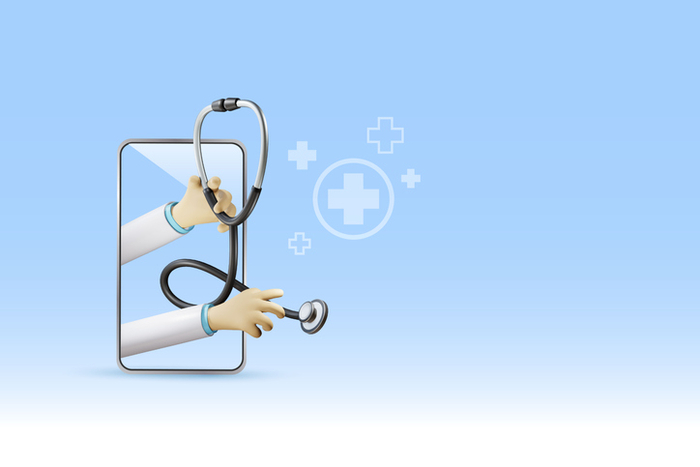
국내 1·2호 디지털치료기기(DTx)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획득한 뒤에도 혁신의료기술평가에 발목이 잡혀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의료기술평가는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면서 해외 디지털치료기기 업체에 비해 국내 업체 시장 진입이 2~3년 가량 늦어지는 문제도 유발한다.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 기업뿐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 의견을 듣고 혁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디지털치료기기 업체는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해외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가장 앞선 정책을 시도하는 독일의 경우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소(BfArM)에서 임상·허가가 이뤄지면 1년 동안 혁신수가를 적용한 후 정식 수가로 이어진다. 이후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국내는 식약처 임상과 허가가 이뤄진 후에도 혁신의료기술 재임상에만 3~5년이 걸린다. 국내 업체들이 재임상을 거치는 동안 독일 등 해외 디지털치료기기 업체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업계 의견을 모아 복지부에 신의료기술 재평가 프로세스 개선을 포함한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혁신의료기술 사용 신고 후 근거창출전문위원회 심의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보고·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후 재평가를 위한 추가 임상을 3차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미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을 실시했는데, 다시 3차 의료기관에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이 대다수인 디지털치료기기 업체 입장에서 부담도 상당하다. 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근거창출전문위원회 심의가 디지털치료기기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임상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 다시 임상을 해야하는데다 특정 진료과만 가능하도록 해 근거 데이터 수집 자체에 제약이 크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시장에 나오지 말라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새로운 영역인 만큼 기존 체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기업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