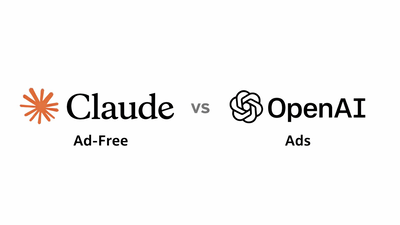태어나서 비행기를 처음 탄 날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출발 전에는 식은땀이 났고, 중력을 거스르며 하늘로 날아오를 때는 짜릿함보다 초조함이 더 컸다. 사고율은 낮다지만 불운의 주인공이 될까 걱정도 많았다. 첫 경험만 그랬다. 반복 경험을 통해 항공 교통의 편리함과 안전에 신뢰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플라잉카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이다.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자동차·항공 업체도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오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한화시스템도 같은 해 시범 운항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대차그룹은 2028년 상용화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은 상당히 공격적이다.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2023년 이후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빠른 서비스 상용화도 중요하지만 내실 다지기가 더 중요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선 서울·경기지역 환승·복합환승센터 계획에 UAM을 반영한 곳이 양재역 한 곳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UAM 로드맵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점검한 결과다.
UAM은 교통정체를 피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지만 이용 편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항공, 철도, 버스, 지하철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이 투자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형 환승센터가 들어설 부지 확보 등에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UAM도 자칫하면 사업 활성화에 실패한 한강 수상택시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 지난해 한강 수상택시 이용자는 2125명으로, 2006년 사업 추진 당시 예상한 하루 평균 1만9500명에는 거리가 멀다. 선착장까지의 접근성 제한, 연계버스 운행체계 미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소비자 가격 저항을 고려할 때 택시와의 요금 격차도 최소화해야 한다. 일부 계층만 이용할 수 있다면 헬리콥터와 다를 게 없다. 산업 성장을 위해서라도 대중화가 가능한 가격 경쟁력이 요구된다. 현대차그룹이 수소연료전지 기반 UAM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 수용 여부는 첫 이용 경험에서 비롯된다. 정부와 기업이 진정한 이동 경험 '혁신'을 일궈 가길 바란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