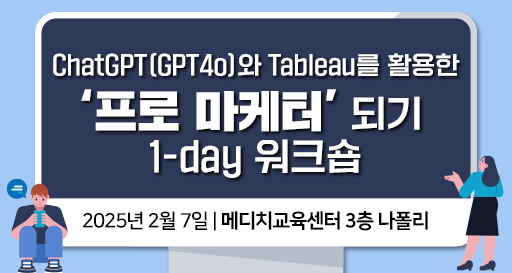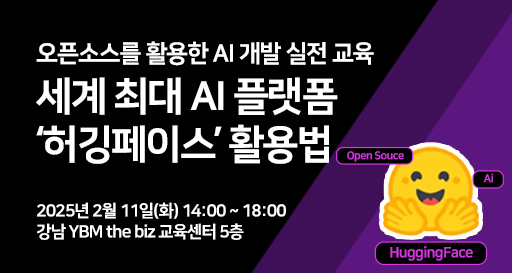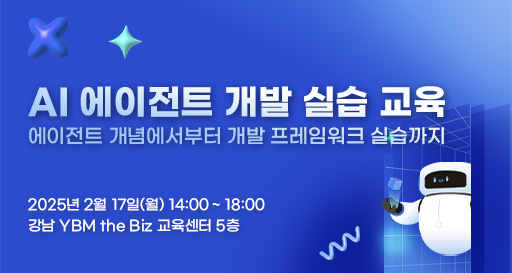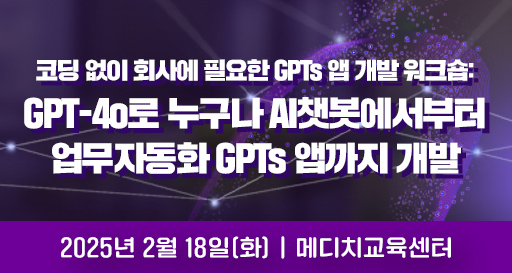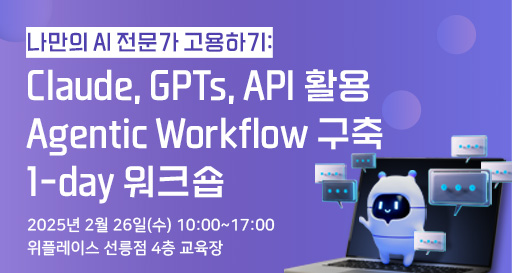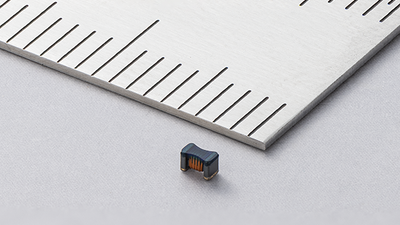다양한 학습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요구가 거세다. 장기화된 원격학습과 학습결손 문제는 미래교육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졌다.
9일 세계 주요국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에듀테크 정책을 민·관 연계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에선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 활용이 활발하고 개별 학교 단위에서 예산 집행권이 자율적이다. 학교별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구입해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도구, 콘텐츠 상호운용을 위한 민관 표준 논의가 활발하다. 영국은 정책, 교육, 리소스,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업무 부하를 점검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사례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과정에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빅데이터와 AI 등 에듀테크 활용 계획도 밝혔다. 오는 2023년 AI 기반 K-에듀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AI를 통한 학생 수준 진단, 학습 특성 분석 등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 교실에선 기가급 무선인터넷 보급을 시작으로 자유로운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교육환경 및 인프라가 구축 중이다. 내년부터 초등 사회·과학·수학 서책 및 디지털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한다.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도 만들어진다.

교육 하드웨어 인프라는 구축 중인데, 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한 제도 기반이 미진하다. 디지털 교육이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의 데이터 활용 정책 정립과 민관 협력 생태계가 필수적이다.
교육 분야에선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 관련 규정이나 분류체계, 관리 제도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원격교육 플랫폼 환경이 구축되면 개인정보 비식별처리나 학생정보 보호 및 관리, 유출 방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에선 지난해 11월 구성한 교육빅데이터 위원회를 통해 올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교육빅데이터위원회가 교육 데이터 수집, 저장, 활용 등의 큰 틀을 빨리 만들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래 교육 플랫폼에 참여할 우수한 국내 교육, 에듀테크 기업과 협력 체계도 요구된다. 비대면 솔루션을 장악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산 기업의 국내 교육시장 점유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클 틀의 민·관·학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협력 체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 주도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에 매달리면 지난 3월과 같은 대규모 접속대란을 피하기 어렵다. 참여업체 역할은 시스템 유지·보수에만 그친다. 지속 가능한 디지털 교육을 위해 민간기업을 공교육 현장에 건전하게 참여·육성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는 스마트 교육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민간의 에듀테크 기업 시스템을 학교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다양한 에듀테크 기업을 지원해 양질의 시스템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