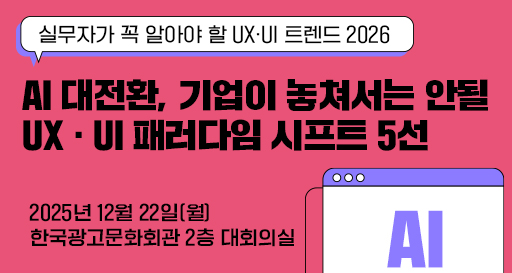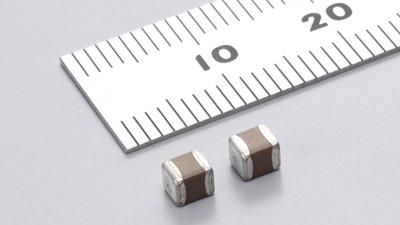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결정한 사안은 항상 옳을까? 다양한 사례를 볼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인의 지식 수준이 높아도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내린 결정은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집단 사고 함정에 대한 지적이다.
이런 상황을 논의할 때 어빙 재니스 미국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가 1972년에 출간한 '집단사고의 희생자들(Victims of Groupthink)'이다.
저자는 오랜 연구 끝에 “아무리 개인의 지식 수준이 높아도 동질성이 짙은 사람들이 모이면 의사 결정의 질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니스 교수는 집단 사고의 함정 조건으로 강력한 집단 응집력과 강력한 지도자 등을 꼽았다. 구성원들이 집단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가 권위적이거나 지시적이라면 이 같은 위험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비판적 사고가 억압받기 쉽다.
그래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 역할이다. 다수파를 향해 의도적으로 비판과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이다. 원래 가톨릭에서 사용되던 말로, 성직자가 더 높은 직분으로 올라갈 때 이뤄지는 심의 단계에서 일부러 후보자의 결점과 미심쩍은 점을 지적하는 역할을 한다. 1983년에 이 제도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다.
집단 사고로 인한 실패 사례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쓰라린 패배 가운데 하나인 1961년 케네디 정부의 쿠바 피그스만 침공 사건을 꼽는다.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대통령은 이 사건 이후 최측근인 남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과 시어도어 소런슨 대통령 고문에게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맡으라고 지시했다. 이후 1년 반 뒤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배치 사건에 대응한 사안은 정반대의 결과를 얻어냈다.
세종대왕도 이 방법을 잘 활용한 사례로 꼽힌다. 어전회의 때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의 예조판서 허조를 참석시켜 이 역할을 맡겼다. 대신들의 집단 사고 병폐를 경계하기 위한 지혜다.
최근 한 신문의 칼럼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는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실상 행간의 의미를 따져 보면 좀 더 많은 민심을 헤아리라는 쓴소리 정도로 '쿨'하게 받아들여도 괜찮았을 내용이다.
결국 어설픈 고발과 고발 취소 과정을 거치며 혹독한 여론의 비판을 받아야 했다.
비단 이런 비판이 여당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미래통합당 등 다른 야당이나 심지어 청와대까지도 이 같은 범주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근 외부는 물론 내부 비판 목소리에도 정도 이상의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더 많이 목격된다.
건전한 조직은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건전한 비판은 물론 때로는 정도 이상의 비난에도 열려 있어야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어느 시대의 악은 시대를 거치며 선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내가, 우리가 옳다는 주장이나 생각이 항상 '절대 가치'를 이어 갈 수는 없다.
응집된 집단은 자기 과신과 폐쇄성에 매몰되어 집단 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10명의 우수한 엘리트로 구성된 집단보다 100명의 일반인 집단 판단이 나을 수도 있다. 때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반영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고, 민주주의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