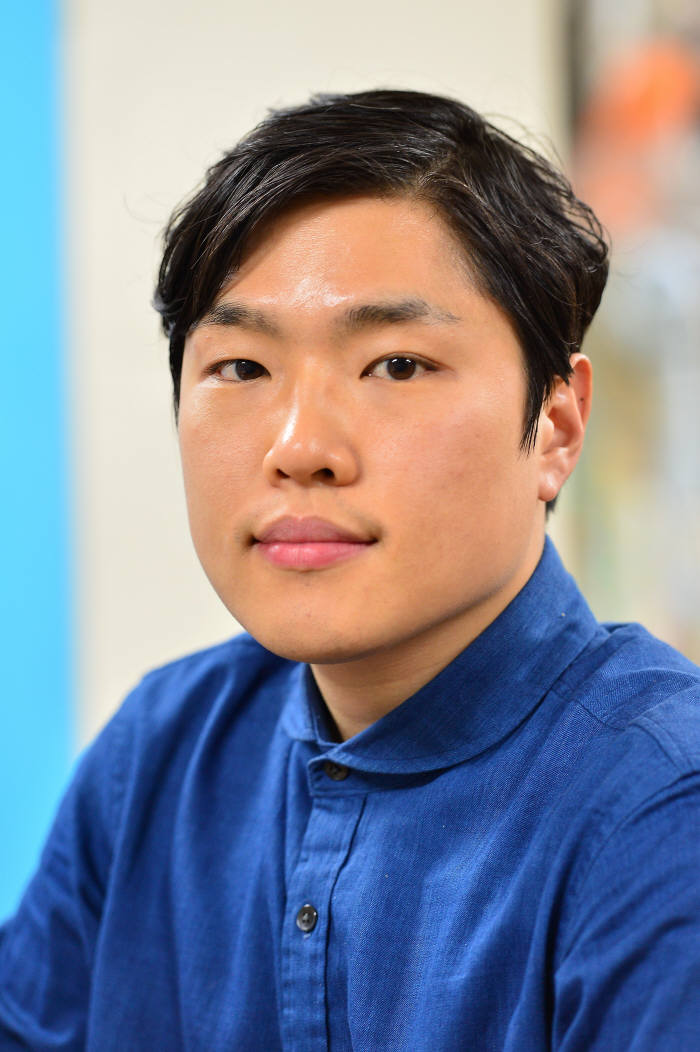
구글이 지난 6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같은 날 한국 국회는 카풀 서비스 출시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에 서비스 유예를 주문했다.
같은 날 다른 곳에서 벌어진 이 상황은 한국이 혁신을 어떻게 다루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기존 산업과 부딪치는 혁신에 대해 논의하고 숙의하는 과정은 지극히 당연한 절차다. 문제는 속도, 해결 의지, 능력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산업·서비스를 육성하겠다는 의욕을 밝혔다. 논의는 2년이 가까워 오는 시간 동안 육성은커녕 후퇴했다.
정부는 합법 경계선에 걸친 카풀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으로 규정, 고발까지 했다. 국회는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는 기존 기득권 산업 주장에 끌려다녔다. 지역 표심을 의식한 국회의 의제 뭉개기는 답답함을 넘어 참담한 지경이다. '카풀이 무슨 혁신이냐'라는 물음은 인식이 얕음을 모르고 있다는 부끄러운 고백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올해 국회는 원천 봉쇄가 불가능한 포털 댓글 매크로 조작을 놓고 기업 발목 잡기에 바빴다.
논의를 환기시키고 마무리해야 할 여당은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게임 산업에서는 논의가 2010년 이전으로 돌아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수용하면 게임 질병화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해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한다. 한국은 최근 수년간 혁신 산업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퇴색했다. 게임 산업은 활로가 막혀 헐떡거리고 있다. 중국에 멱살을 잡힌 꼴이다.
그나마 국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토종 포털은 유튜브 등 글로벌 경쟁자에 안방마저 내줄 처지에 놓였다. 이런 현상은 연령이 낮을수록 두드러진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최근 “3~5년을 투자해도 성공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환경”이라면서 내부에 창업가 DNA를 심으려 한다고 고백했다. 10년 후에 네이버, 카카오라는 이름이 남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 현장은 이렇게 절박한데 우리 행정과 입법은 느긋하다.
정부와 국회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 해결 능력이 없으면 심각한 부작용만 관리하는, 대승 차원의 물러남도 필요하다.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움직이기 마련이다. 정부와 국회 중재를 기다리고 있던 카카오는 결국 7일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미국과 한국 상황은 다르지만 이른 시일 안에 세계 곳곳에서 자율주행과 공유경제가 대세로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은 변함이 없다. 10년 후에 우리가 미룬 2년 때문에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지 장담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8월 '적기조례'를 언급했다. 19세기 영국에서 내연기관차가 마차를 앞서지 못하게 한 규제였다. 대통령은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을 답답해 하며 적기조례를 예로 들었다.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의제는 몇 년만 지나도 크게 의미가 없는 소모성 논쟁에 불과할 공산이 크다.
산업계와 정부, 국회가 모두 답을 알고 있다. 알면서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지금 혁신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