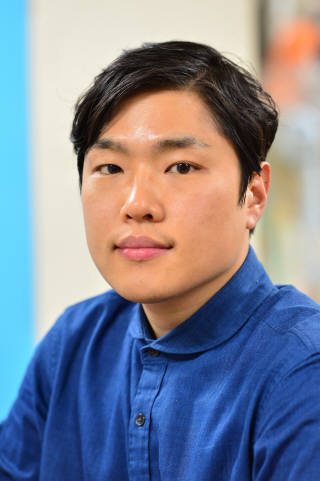
지난해 한국 게임업계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넥슨, 넷마블 등 연간 매출 2조원을 넘는 업체가 두 곳이나 나왔다. 엔씨소프트도 '리니지M'을 필두로 모바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2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끈 새로운 지식재산권(IP)이 등장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새로 상장한 게임회사가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게임업계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일단 대형회사는 지난해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이를 뛰어넘기 만만치 않다.
40%를 웃돌던 게임업계 특유의 높은 영업이익률은 옛 말이 됐다. 출혈경쟁이 시작됐다.
일부 대형회사 글로벌 매출은 신작에 근거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 대부분 2000년대 출시한 게임이 현지 업데이트나 마케팅으로 인기를 유지한다. 기업 인수합병(M&A)에 근거한 것이다. 보유 현금을 투입해 매출을 늘리는데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성장은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시장을 모바일로 끌어들이며 이룬 성공이다. 한국 게임업계가 필살기를 쓴 셈이다. 다행히 이 전략은 주효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중국이 가장 부담스럽다. 모바일 MMORPG를 필두로 국내 게임 시장 전체 규모는 커졌다. 하지만 최상위권을 점령한 대형회사를 제외하면 중견업체들은 중국에 설 자리를 빼앗겼다. 산업계 양극화가 심각하다
중국이 2017년 3월부터 한국게임 유통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한국게임은 중국 수출 판로가 막힌 반면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게임은 늘어났다.
2000년대 우리나라 게임업계 텃밭이었던 중국은 1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인력 투입규모와 제작 속도에서 한국을 능가한지 오래다. 반면 한국 중견 기업은 정체했다.
대형회사와 최근 뜬 신진 게임사 몇 곳을 제외하면 경쟁력 있다고 자부할만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대부분 중견업체는 자사 IP를 중국에 맡겨 개발한다.
중국은 한국 게임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도 금방 따라온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 받은 펍지 '배틀그라운드'는 북미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만든 '포트나이트'는 물론 중국 배틀로얄 게임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배틀그라운드가 10년 이상 생명력을 가지려면 이들과 경쟁해 이겨야 한다.
안일한 인식을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은 이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실체를 직시하도록 '최대 실적' '게임강국' 같은 장밋빛 가림막을 걷어치우는 일이 필요하다.
게임업계는 각 사별로 생존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함께 논의해야한다. 양극화와 글로벌 진출에서 힘을 합칠만한 묘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는 중국 판호 문제를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며 방치하면 안 된다.
한국 게임산업은 199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발전해 2000년대 북미·유럽 등 서구권과 일본 뒤를 잇는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한국이 가졌던 위치를 지금 중국이 위협한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 탄탄한 내수에 제작 경쟁력까지 갖춘 위험한 경쟁자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