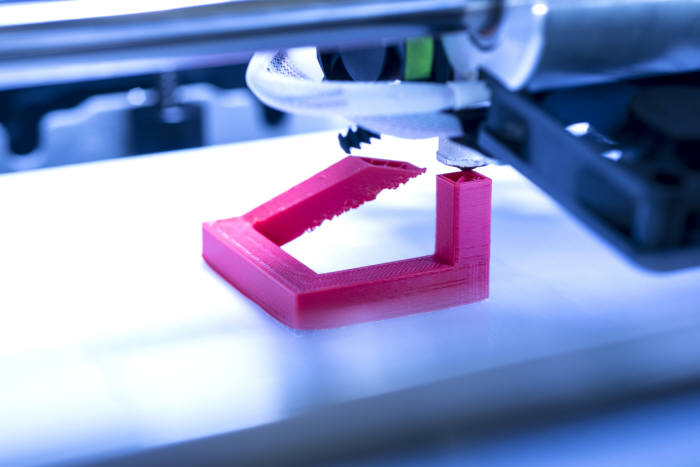
지난해 초 문을 연 한 3D프린터 학원이 사업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 국비지원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하려면 취업률을 올려야 하는데,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비지원 자격을 갖춘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취업률과 기관별 재정 건전성, 수업과정 수료일 등을 1년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이들 잣대 중 취업률에 가장 많은 배점을 부여해 예산을 나눠줄 교육과정과 기관을 가려낸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미 받고 있던 곳이라면 자격이 박탈된다.
신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원들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취업률이 걸림돌이다. 3D프린터 산업의 경우 아직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탓에 강소기업조차 흔치않다.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3D프린터 수업 정원은 20명 안팎으로 맞춰진다. 이 중 취업자 10명을 배출하기도 힘들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창업자를 늘려 취업률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 상업용 3D프린터 한 대 가격은 보통 1억원을 웃돈다. 소액 창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편법을 쓰는 3D프린터 학원도 발생한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대여섯 달 동안, 100만원 상당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접점이 아예 없는 분야 취업을 권유하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취업해달라고 사정하는 곳도 있다.
서울 시내 한 3D프린터 학원 관계자는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어떻게 하든 취업률을 올려야 수업을 계속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D프린터를 포함한 874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훈련과정으로 선정되면 최대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훈련기관 인증평가라는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 합격해도 상·하반기 두 차례 이뤄지는 심사절차를 문제없이 마쳐야 한다. 모든 훈련기관에 나랏돈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이중·삼중으로 조사를 벌인다.
결국 경쟁에서 뒤처진 3D프린터 학원들은 고꾸라질 위기다. 또 다른 학원 관계자는 “취업률 100%에 가까운 간호학원들과 경쟁해야 한다면 누가 버틸 수 있겠냐”면서 “4차 산업혁명 주역을 양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취업률에 목을 매야 한다면 학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훈련기관 선정 시 취업률을 가장 우선 고려하지만, 신생산업에 대해선 훈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실제 취업 가능성 여부를 따져 평가한다”면서 “3년치 훈련실적과 인력수급 현황도 분석하는 등 시장여건을 감안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