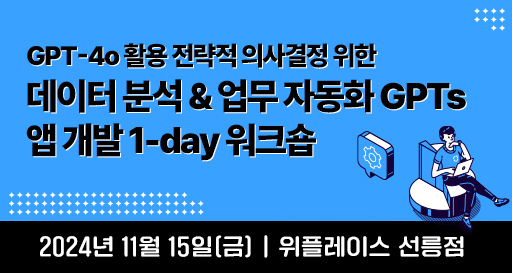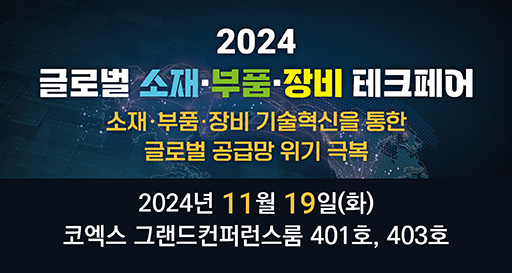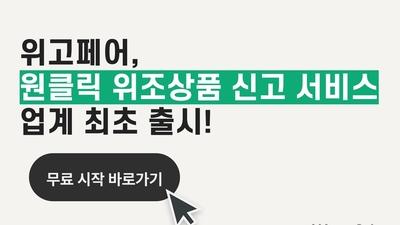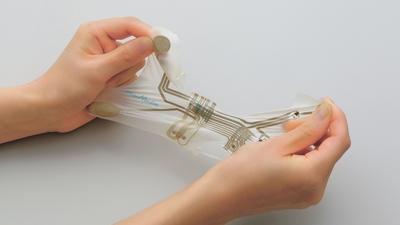문종현 서울산업진흥원(SBA) 기업성장본부장
불과 10여년 밖에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진 게임 산업은 어느 순간 콘텐츠산업의 대표주자가 됐다.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고 실제로 NHN엔터테인먼트, 넥슨과 같은 초대형 메이저 게임회사들은 재계순위를 바꿀 만큼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초강국이었다. 2009년 독일 라이프치히 GCO(Games Convention Online) 행사에서 독일 작센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을 “온라인 게임의 조국”이라고 칭하는 존대까지도 서슴지 않았을 정도였으니.
그런데 콘텐츠 카피를 전문으로 하던 중국의 게임사들이 대한민국의 온라인 게임을 모방하는 듯하더니, 물량공세로 우리의 온라인 게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 앗아가고는 결국 2010년을 전후해 1위를 빼앗아 갔다. 뒤늦은 우리의 1위 탈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 이제는 따라가기도 바쁜 상황이 됐다.
2009년 SBA 베트남 호치민 게임 시장개척단을 인솔하며, 베트남 소프트웨어 협회(VINASA, Vietnam Software and IT Service Association)와 MOU를 체결할 당시만 해도 호치민 시내 PC방에는 한국 온라인게임 특유의 게임 칼라인 검정과 파랑이 휩쓸었다. 몇 년 후 다시 찾은 베트남은 물론,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게임유저들은 어느새 붉은 색의 중국 게임에 몰입하고 있었고, 그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 후 중국과의 격차는 점점 더 커졌고 중국은 한국 게임을 잡아먹는 하마가 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메이저 게임 퍼블리셔들마저도 우리의 신규게임을 사는 대신 중국의 게임 개발사과 라이센싱 계약하고 퍼블리싱한다. 한국 게임사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힘겨운 개발 싸움 끝에 손을 놓기도 하고 다른 분야인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도 한다.
사실 우리가 온라인 게임 1위였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게임시장 내에서의 온라인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 미만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약한 비디오콘솔게임 시장이 일본,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는 더 활발하며 게임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60% 이상이다. 고작 10% 미만의 작은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온라인 게임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는 온라인 게임 개발에 몰입하던 국내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 시대가 열리자, 앞다투어 모바일 기반의 게임에 전력질주했으나, 일부 성공한 게임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 개발사는 콘텐츠 경쟁에 뒤처지거나 시장선점을 중국 게임사에게 뺏기고 인건비도 못 건진 채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했다. 겨우 개발해 퍼블리싱을 해볼까 시도도 하지만, 대형 퍼블리셔와의 계약은, 최근 유행하는 우스갯소리를 빌리자면, “그냥 주고 떠나라고 전해라”인 상황이다.
제살깎기식 경쟁의 심화가 만들어낸 상황이다. 앞 뒤 안 따지고 시작하기, 남이 가는 길 무턱대고 쫓아가기 식의 누군가 잘 된다는, 누군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트렌드만을 따라가는 묻지마 개발 방식은, 물론 게임 개발 및 발매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이 봇물을 이뤘다. 물론 IMF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들이긴 했으나,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천억 방출 업무를 맡았던 필자, 자금을 지원하는 책임자로서 걱정이 앞섰었다. 자금을 지원받은 벤처기업 중 90% 이상은 3, 4년 후 지원받은 자금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물론 성공벤처들도 많이 나왔지만, 너나없이 받아간 자금으로 한동안은 유지를 했으나, 결국엔 개발비로 인건비로 자금은 소진하였는데 개발한 기술은 상용화되지 않거나 유사기술에 치어 사장돼 부도 맞은 벤처기업들의 수가 더 많았다. 앞뒤 가리지 않은 벤처붐의 말로는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다.
최근 TV를 보고 있자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뉴스들이 빈번하게 보인다. 인공지능에 대한 갑작스런 그러나 지대한 관심.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에 고전을 면치 못하니, 도대체 인공지능이 뭐냐는 대중의 관심 집중. 정책개발자는 말한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그럼 과거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원이 필요 없었나? 바둑 하나로 인해 인공지능이 필요해졌나?
대중의 관심 여하에 상관없이 미래 예측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책을 펼쳐야지, 대중의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느닷없이 지원을 집중해야 한단 말인가. 왜 정부의 정책도, 기술개발자도 시류에 몰려다닐까. 블루오션은 책으로만 읽고, 현실은 트렌드를 쫓아 레드오션으로 몰려들면 미래도 없고 대박도 없다. 너무 유행만 쫒지 말고 미래를 예측하고 가야할 길을 꿋꿋이 가고, 정책입안자는 필요한 미래 먹거리를 찾아 꾸준하고 계속적인 정책지원을 하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운 7080세대의 노력은 높이 사야 마땅하지만 사실 바꿔야 할 문화도 많았다. 일명 ‘다같이 문화.’ 남이 안 하는 거 하면 눈치 보이고 튀는 거 싫어하는, 다양성에 반하는, 창의성을 죽이는 문화. 멍석을 깔아주면 그 때서야 몰려들어 무언가를 힘내어 하던 문화. 이미 사라졌어야 하는 문화가 아직도 잔재함이 안타깝다. 조용한 세상에 알파고라는 멍석을 깔아주니 인공지능에 불을 지폈다. 아마 지금쯤 정책입안자들은 인공지능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부디 후세대는 바뀌기를 기대한다.
알파고가 TV에 나와서 바둑을 두던 안 두던,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는 미래 예측은 많았다. 그러한 미래예측에 의거해 인공지능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는 기업, 그리고 10년, 20년, 수십 년을 내다보며 장기적으로 꾸준한 정책지원을 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추신. 이 칼럼의 초고를 쓴 날 저녁 9시뉴스에 정부가 인공지능기술에 1조를 지원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씁쓸하다. 그러나 미래는 꼭 바뀌리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