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가 현실화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기능이 종종 멈추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국(DMV)은 보쉬·델파이·구글·닛산·메르세데스-벤츠·테슬라·폭스바겐 등 7개 자동차 업체가 제출한 ‘자율주행 기능 해제 보고서’를 13일(현지시각)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자율주행 도중 해당 기능이 해제된 사례가 업체별로 기록돼 있다. 주행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사례도 있었다.
◇자율주행 기능, 보쉬 ‘꼴찌’
보고서에 따르면 7개 업체 중 보쉬가 자율주행 기능이 가장 떨어진다. 1500㎞를 주행하는 동안 무려 625번이나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됐다. 100㎞당 41번이 넘는 수치다. 자율주행 기능으로 채 3㎞를 가지 못하는 셈이다.
1위는 구글이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해제 건수를 ‘0’으로 보고했지만 주행거리가 누락돼 있어 제외했다. 구글 자율주행차가 테스트 도중 멈춰선 것은 총 341번이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68만㎞가 넘는다. 2000㎞를 달려야 한 번 정도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됐다.
2위는 폭스바겐으로 100㎞당 1건 미만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완성차 업체인 벤츠는 동일한 거리에서 37번 넘게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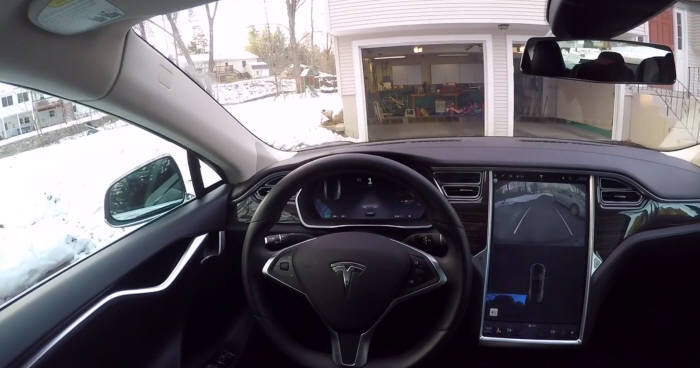
◇자율주행차도 엄연한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곳은 많지만 성과가 더딘 이유는 간단하다. 이해 부족이다.
7개 기업 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록한 구글 역시 IT기업이지 자동차회사가 아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했다. 자율주행차를 IT기기로 간주했다. 전기차 기반으로 개발 중이지만 자율주행차도 엄연한 자동차다. 100년이 넘는 유럽과 미국 자동차 기업 역사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내로라하는 자동차 메이커가 없는 이유다.
벤츠나 폭스바겐이 순수 자율주행 기능에서 구글에 밀리는 이유는 IT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IT기업과 자동차제조기업 간 협력이 늘어날 전망이다.
구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존 크라프칙 CEO도 최근 월드 콩그레스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크라프칙 CEO는 “앞으로 더 많은 회사와 자율주행차 관련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0% 자율주행 어려워
구글이 자율주행 기능면에서 가장 우수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구글이 겪은 자율주행 해제 사례 중 272건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일어났다. 감지 기능과 제어 기능이 제 때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차량이 스스로 경고음이 울리고 멈춰선 경우다.
나머지 69건은 사람이 미리 판단해서 수동운전으로 전환했다.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개입한 것이다. 이 중 13건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외부 물체와 부딪쳤을 것으로 구글은 설명했다.자율주행 해제 341건 가운데 304건이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변수가 많은 곳에서 재빠른 대응이 힘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변 차량이나 행인 등과 정보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식 실패와 SW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다. 주변 통제가 100% 이뤄지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분명 한계가 있다.
자율주행 기능 해제 건수는 적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구글 보고서에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한 거리가 23.4%에 달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가 없으면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구글은 이에 대해 “이러한 사고는 드물다”며 “접촉 사고 방지 등 자율주행차 안전 운행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별 자율주행 기능 해제 건수 비교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