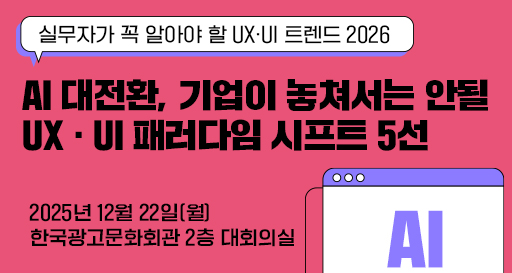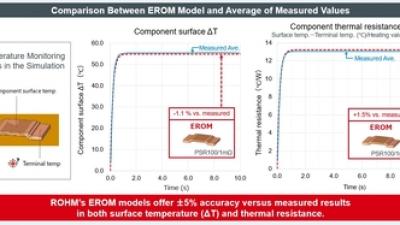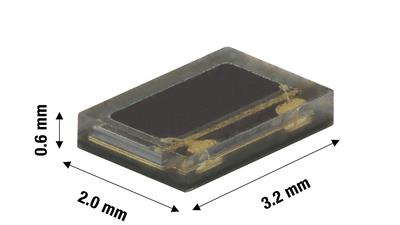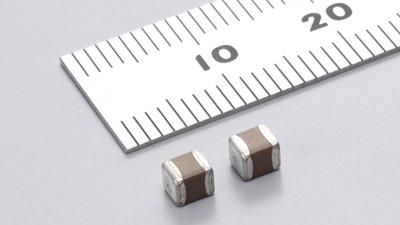해외에서는 이미 시대변화에 따른 인터넷, 메신저 감청 제도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됐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테러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는 ‘프리즘’을 운영 중이라고 폭로한 뒤 사이버 감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이후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프리즘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9개 인터넷 기업인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유튜브 △스카이프 △야후 △AOL △팔톡을 통해 오가는 이메일, 채팅, 비디오, 사진, 데이터, 인터넷전화(VoIP)를 감시하는 프로젝트였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최소 5개 국가가 이 프로젝트에 연관돼 서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프리즘 사태가 불거진 이후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른 영장 발부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감청 장비 설치를 용인했던 인터넷 기업들은 자체 암호화 기술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등 시민단체는 주요 인터넷 기업의 암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프리즘 사태 이후 미국은 새로운 인터넷 체제 아래 개인정보보호와 정부의 사회 안전기능을 조율하는 논의가 활발하다”며 “기업과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가 모여 중지를 모으고 보다 고도화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카카오톡 감청 사태가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흐려지는 것보다 미국의 사례를 면밀히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의 최근 소송이 대표적인 예다. 트위터는 최근 감청 요청 건수를 공개할 수 없게 한 미국 수정헌법을 근거로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요청한 감청의뢰 건수를 기업이 밝힐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다음카카오가 이번 논란 이후 정부의 감청 의뢰건수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는 암호화 키(Key)를 기업,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나눠 가지고 적법한 영장발부에만 이를 조합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각자 위치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개인정보보호와 정부의 사회안전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손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