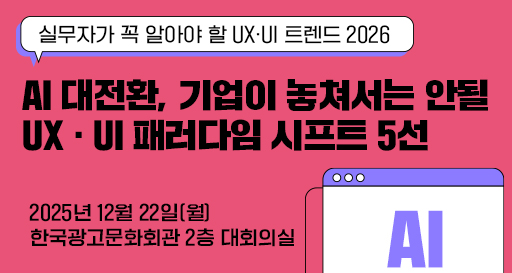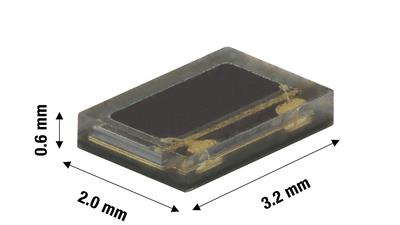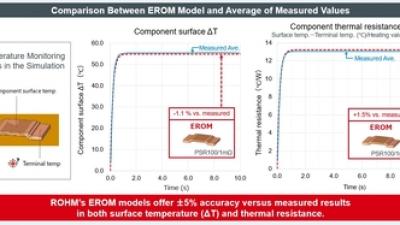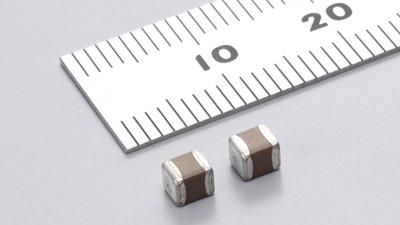프라이버시 보호와 명예훼손 방지는 각각 중요한 법적 가치를 갖는다. 역사적으로 각 나라는 해당 사회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접근법을 달리해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인터넷 산업이 발전한 우리나라 역시 그 동안 등한시 해 왔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그 동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유통이라는 역기능 피해도 많이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 때 사이버 모욕제 법제 도입이 추진되기도 했다.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는 특정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특징으로 한 인터넷 세상에서 디지털 흔적은 지우기 힘들뿐 아니라 오프라인에 비해 전파성도 빠르다.
5년 전 미네르바, 광우병 사태에 이은 사이버 망명이 카카오톡으로 넘어왔다. 그 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에는 모바일 메신저다. 잠재적 검열의 대상이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옮겨왔고, 일상의 대화와 삶이 감시 대상이 된 게 차이점이다. 2009년 6월에는 검찰이 광우병 보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작가 이메일을 공개하자, 사이버 망명이 대거 일어났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 지메일이 피신처였다.
이 같은 사이버 망명이 일어나는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우선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다. 누가 엿보고 있다는 일방적 시선에 대한 불안심리도 한몫한다.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이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항변하지 않을까. 사적공간 공간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대비책일 수도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있을 것이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찰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한 결과다.
사람들의 얼굴은 카메라 앞에만 서면 경직된다. 표정은 부자연스럽고, 안면근육은 굳는다. 짧은 순간일 수 있지만 렌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렌즈의 시선 자체가 권력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피사체는 찍힘을 잘(?) 당하거나, 아예 촬영장을 떠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카카오톡에서 사이버 망명을 하는 이들은 후자의 방법을 택한 셈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일시적 유행을 쫓는다고 하기에는 적지 않은 숫자다. 1주일 새 150만명이 이상이 보안성이 높다는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갈아탔다. 여의도 정치인부터 공무원까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메신저 서비스의 주 사용무대를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서버로 옮겼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와 카카오톡 사용자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 2012년 9월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사이버 모욕법 도입 추진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인터넷 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동시다발적으로 적잖은 국민들이 외국 대사관의 사이버 담벼락을 넘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사이버 세상에서 국적을 바꾸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모바일 메신저라는 기술이 하나의 사회적 문화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등장하는 것은 통과의례다. 하지만, 150만명의 동시다발적 망명은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에 무엇인가를 암시한다. 비정상의 정상화 대상은 150만명인가, 일방적 시선인가?
김원석 글로벌뉴스부 부장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