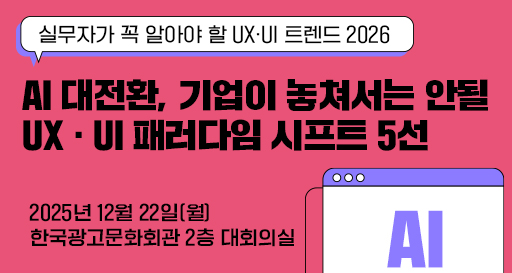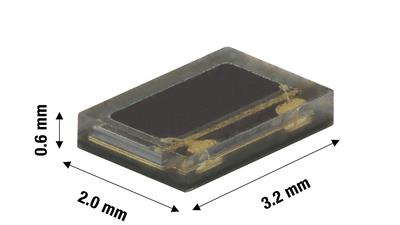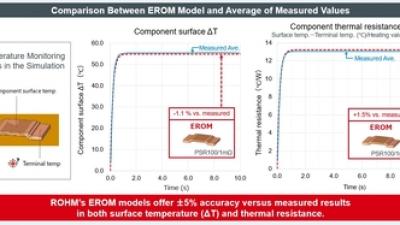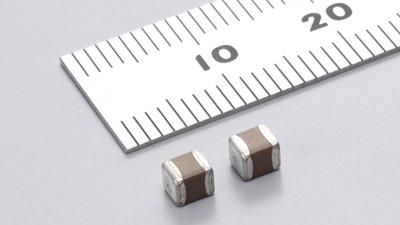최근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간 합종연횡이 이어지면서 국내 업계에서도 인수합병(M&A)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최대 장비 구매처인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국내 업체들에 M&A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김기남 신임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회장은 취임사에서 “선진 업체들은 M&A로 규모를 더욱 키워가고 있다”며 “우리도 소자, 소재, 장비 등 전 분야에서 M&A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장비·소재 등 협력업체 모임인 협성회에서 M&A를 독려한 바 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4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로드맵 세미나’에서도 삼성전자는 M&A를 촉구했다.
구매 업체인 삼성전자가 직접 M&A를 강조하는 이유는 글로벌 장비업체들이 M&A를 통해 공룡처럼 커지면서 협상력을 장비 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반도체 미세 회로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인 노광(리소그래피) 분야 이머전 장비와 웨이퍼 측정 장비는 네덜란드 ASML과 이스라엘 KLA텐코에 종속돼 있다. 증착(디벨로퍼)·식각(에칭) 장비마저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와 일본 도쿄일렉트론(TEL)이 합병하고 램리서치와 노벨러스가 합치면서 소수 업체가 독점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3차원(D)화 되면서 성능 기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연구개발(R&D)에 한계가 있다. 국산 장비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장비를 전체 공정에 구축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부분에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했다.
실시간 기술 지원이 가능한 대규모 국내 장비 협력사가 있어야만 공정 개발이나 수율 개선에도 유리하다.
하지만 M&A에 대한 업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대주주인 금융 자본이 합병을 결정하는 미국·일본과 달리 한국 업체들은 대부분 주인(오너) 있는 회사기 때문이다. 이해 관계를 조정해 M&A를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한동안 M&A 이슈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장비업체 스스로 매각을 고민하지 않는 한 풀기 힘든 문제”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