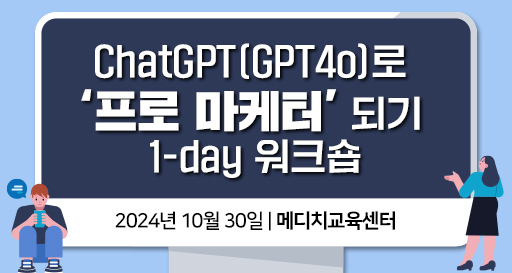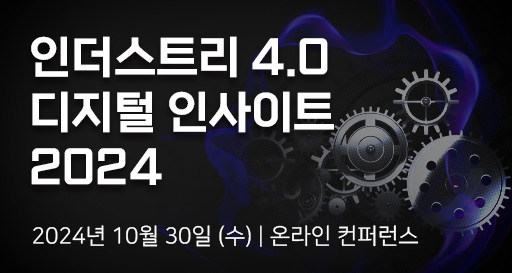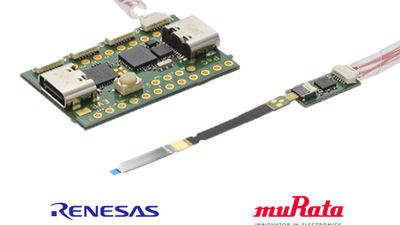최근 인기를 끈 TV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덕분에 대만을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IT 업계 지인 한 명이 그 대열에 동참했다. 최근에 만난 그는 타이베이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묻는 질문에 편의점을 꼽았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마천루 101타워나 싸고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스린 야시장이 아닌 고작 편의점이라는 말에 궁금증이 높아졌다.
이유는 간단했다. 타이베이 편의점에서 60인치 LCD TV를 팔고 있었기 때문이다. 컵라면이나 콜라와 마찬가지로 대형 TV가 편의점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가격이다. 3만9999대만달러, 142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온라인쇼핑 최저가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파격가다.
IT 업계 종사자 아니랄까봐 지인은 요모조모 살펴보고 점원에게도 물어봤다. 예상과 달리 중국산이 아니었다. 제조사는 대만 혼하이, 패널은 일본 샤프가 만들었다. 풀HD 화질은 기본이고 각종 편의장치도 빠지지 않았다. 한 때 디지털 가전 업계 기술 경쟁의 최고봉이었던 LCD TV가 동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세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인의 말을 듣는 동안 지난 10월 도쿄 출장에서 본 광경이 문득 떠올랐다. 도쿄 번화가인 유라쿠초 인근 전자 양판점 빅카메라 1층에서 쌀을 팔고 있었다. `햅쌀 한정 판매`라는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전자상가에 쌀이 진열된 모습은 낯설었다.
쌀과 함께 1층은 스마트폰이 점령했다. TV는 2층으로 밀려났다. 5년 전만 해도 일본 전자상가 1층은 TV의 전유물이었다. 1층은 그나마 고객으로 붐볐지만 2층은 썰렁했다.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일본 전자산업의 쇠퇴, 그 중에서도 추락하는 TV는 날개를 찾기 어려웠다.
대만 편의점에 TV가 진열되고 일본 전자상가에서 쌀을 파는 현실은 격변의 TV 시장을 상징하는 메타포다. 더 이상 TV는 기술 중심 상품이 아니다. 패널 시장은 한국 주도 하에 회생하려는 일본과 도약을 꾀하는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심각한 공급 과잉을 빚고 있다. 오죽하면 LCD 기술의 메카로 자부하던 샤프가 편의점에서 파는 TV에 패널을 공급했을까.
크기와 화질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업계의 전략도 잘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어지간히 큰 집이 아니고서 60인치 이상의 TV는 부담스럽다. 풀HD에 이어 등장한 UHD의 생생함을 채워줄 영상 콘텐츠는 걸음마 단계다. OLED TV처럼 패러다임이 다른 제품은 1000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엄두를 내기 어렵다.
결국 한국의 브랜드 파워와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맞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재기는 자국 언론조차 비관적이다. 아직은 한국이 유리하다. 기술도 브랜드도 모두 세계 최고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30년 넘게 세계를 지배했던 소니 TV의 아성도 한순간에 무너졌다. 중국이 브랜드 파워를 갖춘다면 삼성이나 LG를 치고 올라올 수 있다.
1925년 존 로지 베어드가 최초의 TV를 만든 이래 눈부신 혁신이 이어졌다. 미래의 TV는 거실을 떠나 방마다 벽이나 천장에 붙을 수도 있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개인 TV 시대를 열 가능성도 높다.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도 100조원 규모가 넘는 TV 시장은 존재한다. TV시장의 코리아시대는 영원할까.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