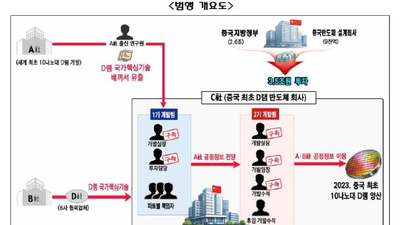2000년대 초반 한국에는 팹리스 열풍이 일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등에서 시스템반도체를 연구하던 인력이 대거 쏟아져 나와 창업 붐을 형성했다. 2000년대 중반 들어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팹리스가 생겨나고,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에 인수합병(M&A)되는 회사들도 나오면서 성공 신화가 하나둘 나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기로에 섰다. 주력 분야였던 멀티미디어 회로설계 기술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시스템온칩(SoC)으로 흡수됐고,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성장해 온 디스플레이 구동 부품도 몇 년째 성장 정체다. 기대를 모았던 아날로그반도체마저 AP 등에 일부 기능이 흡수되면서 활로를 찾지 못했다. 지난 3~4년 전부터 팹리스 업체들이 준비해 온 근거리무선통신(NFC), 전자태그(RFID)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다. 보안 카메라용 이미지시그널프로세서(ISP) 등은 국내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벌이며 개발 동력을 잃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방안은 없는지 기획 시리즈를 통해 모색해본다.
한국에 `팹리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시스템 반도체 업체는 대부분 멀티미디어 프로세싱, 압축(인코딩)·복호(디코딩) 기술에 주목했다. 멀티미디어 반도체 시장을 좇아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에 쏠림현상도 생겨났다. 삼성전자·LG전자 등이 AP를 직접 개발하면서 인력을 상당수 흡수했지만 여전히 팹리스 업계의 주류는 멀티미디어 설계 엔지니어들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을 활용해 스마트폰·스마트패드 외 분야에서 AP SoC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조한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 SW-SoC R&BD 센터장은 “소프트웨어(SW)와 융합한 SoC 기술을 확보한다면 국내 AP 업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스마트폰 AP 이외 시장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PC 및 모바일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 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 TV, 의료, 센서 프로세서 시장이다. 국내 중소기업인 텔레칩스는 MP3용 디지털멀티미디어프로세서(DMP)에 주력했지만 지금은 차량용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AVN) 시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벤츠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AP를 공급한다. 작년 AP 매출 가운데 수출 비중은 내수의 약 두 배에 이른다. 최근에는 일본 통신 사업자에 스마트TV 셋톱박스용 AP를 공급하며 방송 인터넷 기반 미디어 서비스(OTT) 시장에도 진출했다. 브로드컴과 ST마이크로가 장악한 이 시장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ARM 기반 칩을 개발한 후발 주자들이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ETRI가 지난 4월 발간한 전자통신동향분석에 따르면 스마트TV 셋톱박스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현재 8억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오는 2016년까지 연평균 39%씩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기·센서 시장도 AP의 역할이 필수다. 애플은 `아이폰5S`에 중앙 AP인 `A7`과 더불어 보조 프로세서 `M7`를 장착했다. 가속도·위치·중력·자이로 등 각종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별도로 연산하는 프로세서다. 여러 기기가 복잡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IoT) 시대에는 기존 AP가 감당하기 힘든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보조 프로세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뎀(베이스밴드) 통합 AP SoC 기술 개발에 뒤처진 한국 팹리스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지난달 ARM이 IoT용 SW 업체인 센시노드를 인수하면서 ARM 기반 프로세서 개발사에 힘을 실어줬다.
잠재력이 큰 AP 시장에 조기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SW 경쟁력이 필요하다. 이혁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시스템반도체 PD는 “모바일 AP 이외의 시장을 찾는 한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임베디드 SW 인력을 확보해야 AP SoC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