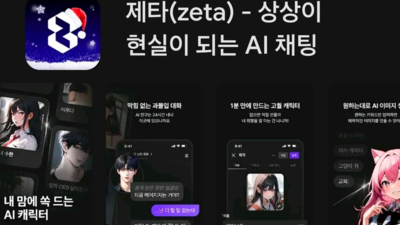실타래는 실을 쉽게 풀어내 쓸 수 있도록 감아 놓은 뭉치다. 실이 풀려진 첫머리를 잡고 바늘에 꿰어 옷을 짓는다. 실타래에 풀려있는 실은 두 쪽이다. 하나는 살타래 겉에 풀려 실제로 사용하는 쪽이다. 다른 한쪽은 실타래 안에 감겨있다. 가끔 안쪽 실을 잡아 당겨 쓸 때가 있는데, 어느 정도 풀렸다가 묶인 실타래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다.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가는 첫머리가 실마리인데 안쪽 실을 잡아당길 경우 실마리를 풀지 못한다.

특허청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실마리를 잡아 당겼다. 36년만에 융복합 기술 환경에 맞춘 대규모 심사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1977년 특허청이 문을 연 후 전통 산업 중심에서 최신 기술 트렌드에 적합한 개방형 심사조직을 만들기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허청 심사조직 개편은 특허 강국 대한민국 이면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세계 5대 특허 주요국(IP5), 특허 출원 규모 세계 4위 등 지식재산(IP)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칭찬할 점은 많다. 그러나 그 뒤에는 만성 기술무역적자국, 낮은 특허 품질, 영세한 IP 산업 규모 등 그늘도 짙다.
특허 심사 조직 개편은 분명 효율적인 심사 시스템을 만들고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기술을 개발하듯 기술을 권리화 하는 것도 사람의 몫이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 수는 795명이다. 1인당 연간 심사건수는 271건이다. 미국 78건, 유럽 47건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다. 심사관이 특허명세서에 쌓여 허덕인다면 고품질 특허는 나올 수 없다.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돌아봐야 한다.
최근 미국도 특허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허청 권한을 강화해 대규모 인력 확충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인력 제한이 항상 걸림돌이다. 이번 조직 개편이 끝까지 박수받기 위해서는 진짜 실마리를 잡아당기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