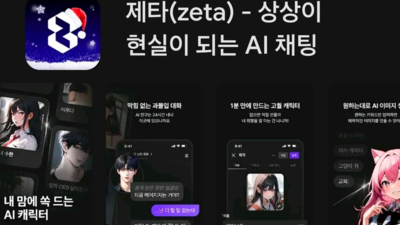갑(甲)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이에 대한 을(乙)의 반란이 이어지면서 삐뚤어진 갑을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문제가 된 기업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도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나섰다.

당장 현실화 가능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졌다. 그 중 하나가 거래, 고용 관계에서 갑과 을이란 용어를 배제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연구개발 계약서에서 갑, 을 용어를 뺐다고 밝힌데 이어 국방부도 각종 계약서에서 갑과 을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에 갑과 을 대신 사업주와 근로자란 말을 쓰기로 했다. 지자체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울 강북구청이 동참했다.
`전담기관` `근로자` `계약상대자` 등 멀쩡한 말을 놔두고 굳이 을이란 말을 써온 관행을 개선한다니 늦었지만 박수를 보낼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다. 계약서에서 갑과 을이란 말을 지워버린 후가 더 중요하다. 이른바 `라면 상무` `물량 밀어내기` 등의 사고는 당사자들이 갑과 을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승무원, 대리점주 어느 누구에게도 을이라는 표식은 없다.
계약서에서 갑과 을을 지워도 그럴듯한 말로 대체해도 그릇된 관행이 존재하는 한 갑을 관계까지 지울 수는 없다.
최근 열린 중소기업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은 “정부가 대기업에 `제값주기`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공공기관 입찰에서는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후 추가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된다”며 “`당신이 포기하면 다른 곳으로 돌리면 된다`는 식으로 갑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우니 버틸 도리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바야흐로 창조경제 시대다. 의미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시작은 모든 경제주체가 창조적인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축이 아닐까. 이때 비로소 갑과 을이란 말을 고어사전에서나 찾을 수 있는 세상도 열릴 것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